
18세기 문인화가 이윤영이 부소산 고란사를 그렸다. 이 그림을 보면 고란사→백마강→낙화암→부여가 자연스레 연결되며 백제의 미완의 역사, 깊은 문화적 숨결이 떠올려진다. 백제의 국제성과 높은 문화력을 확인시켜준 무령왕릉, 백제인의 세계관과 예술미의 현현인 금동용봉봉래산향로 등을 알 수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이런 역사적 감정이 있었을까?
이윤영은 왜 '고란사'를 그렸는지, 언제 여기에 갔는지 밝혀놓았다.
무진년(1748) 봄 고란사에서 반천(盤泉) 윤 어르신(윤심형)을 만나고 돌아왔다가 지리산으로 원령(이인상)을 방문해 그 강산의 빼어남을 이야기하다 말로 전할 수 없어 마른 먹으로 대략 ( )폭에 그려 한 번 웃게 한다. 윤영(이윤영)
戊辰春 會盤泉尹丈於皐蘭寺 歸訪元靈於智異山中 話其江山之勝 有言語不可傳者 略用乾墨( )幅 以發一笑 胤永
고란사의 멋진 경치를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 것이다. 옅은 담채와 차분하고 세심한 붓질의 사의(寫意)적 실경산수화다. 나룻배가 제일 앞쪽에 있는 시점으로 알 수 있듯 이윤영 일행은 배를 타고 백마강을 두루 선유하며 강 위에서 고란사와 인근의 경치를 감상했다.
그러고 나서 이윤영은 지리산과 가까운 함양의 사근역 찰방으로 근무하던 이인상을 찾아가 담소하던 중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능호관 이인상이 4살 위다. 이윤영은 여말선초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목은 이색의 후손인 한산 이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0대에 학문과 문장에 재능을 인정받았으나 과거를 보지 않았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외부적 요인보다는 본인의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다.
벼슬하지 않은 지식인을 은사(隱士), 포의(布衣), 백의(白衣) 등으로 불렀다. 이윤영은 자신을 스스로 처사(處士), 산인(山人)이라고 했다. 지인들과 청담(淸談)을 나누고, 고동서화를 수집하고, 전국의 명승명소를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향유한 여행자의 삶을 살며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충북 단양의 산수를 사랑해 단릉(丹陵)으로 호를 지었고 몇 년 간 살기도 했다.
그림의 왼쪽 아래 인장은 '두류만리(頭流慢吏)', "두류산의 게으른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두류산은 곧 지리산으로 이인상의 인장이다. 만리의 게으를 만(慢) 자는 옛 분들의 겸양하는 표현인 겸사(謙辭)로 관직을 지냈다는 뜻이다. 게으를 나(懶), 한가할 한(閑), 흩을 산(散) 등을 호에 붙이며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자아와 사회와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이인상에게 그려준 그림이므로 이인상의 인장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분의 우정이 이렇게 남았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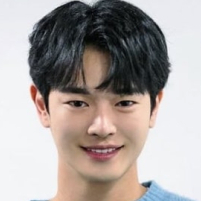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은 어떤가" 제안
한동훈 "우리가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