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나라가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던 시절에도 총칼이 아닌 뜻과 실천으로 독립을 일군 이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위대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白山 安熙濟, 1885~1943) 선생은 조용하지만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사람이었다. 뜻을 세운 뒤 사익은 단호히 버리고 평생 자신의 재산과 역량을, 끝내는 목숨까지도 오롯이 조국에 바쳤다. 1914년 부산에 설립한 백산상회와 이어진 백산무역주식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상은 독립군의 군자금 창고이자 항일투쟁의 후방기지였다.
최준, 윤현태 등 영남의 애국적 자산가들이 대다수 주주로 참여해, 그 재정적 기반이 곧 무장독립운동의 생명줄이 되었다. 안희제 선생은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고 자금을 고스란히 독립운동에 바쳤으며, 이는 단순한 미담이 아닌 독립운동의 토대를 지탱한 실질적인 힘이었다.
그의 투쟁은 무기 대신 경제와 교육을 무기로 삼았다. 만주에 세운 발해농장(渤海農場)은 겉으로는 농장이었지만, 실상은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군자금을 마련하는 비밀 거점이었다. '자립 없이 독립 없다'는 그의 신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황무지를 갈아엎어 씨앗을 심으며 스스로 실천한 삶의 원칙이었다.
그는 동아일보와 중외일보 경영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기미육영회를 조직하여 청년 인재를 길러냈다. 또한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 정보망을 구축하고, 항일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놓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활동은 국내외에서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였으며, 무명의 투사들이 버틸 수 있는 토대였다.
해방 후 귀국한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지원의 6할은 백산의 몫이다"라며 백산 선생의 고향인 의령 쪽을 향해 고개 숙여 큰절을 올렸다는 일화는 그만큼 모든 능력을 동원해 임시정부 재정을 뒷받침했던 백산 선생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언론과 교육으로 민족정신을 지켜낸 것도 또 하나의 치열한 전선이었다.
그의 말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수년간 일제의 끈질기고 치밀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끝내 체포된 그는, 모진 고문과 옥고를 견디다 1943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불과 세 시간 만에 눈을 감았다. 광복을 2년 앞둔 시점이었다. 이루지 못한 꿈은 남았지만, 그 절개의 정신은 꺼지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다. 백야(白冶) 김좌진, 백범(白凡) 김구, 백산(白山) 안희제. 해방의 불꽃이자 영웅이었던 그들이 삼백(三白)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중 백산 안희제 선생은 백범 김구를 비롯한 항일독립투사들이 가슴깊이 기억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했던 불꽃이었다.
美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소중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백산 선생의 삶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며,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 정신은 새로운 행동을 낳는다.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새로운 백 년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백산 안희제 선생께 드리는 진정한 헌사일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고문 정영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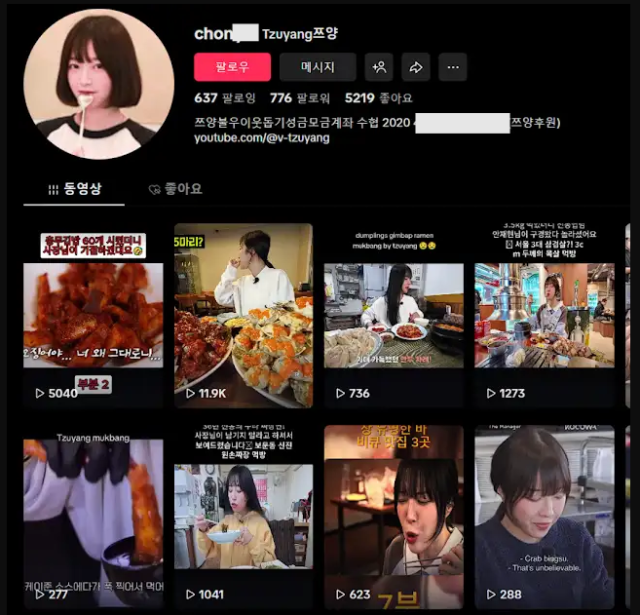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