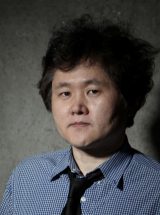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대구 사람이라면서 사투리 왜 그렇게 몰라요?"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대구에 산다고 해서 사투리를 능숙히 구사하리라는 기대는 편견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표준어 중심 교육, 방송 언어의 획일화, 수도권 중심 문화 속에서 방언이나 사투리란 단어조차 낯설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사투리는 단지 지역 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역 정서, 풍경, 삶의 방식이 녹아 있다. 어릴 적 집에서 쓰던 말들은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웠던가. 대구 사투리에는 특별한 정감이 있었다.
'선나'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양, '그단새'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거랑'은 개울, '찌짐'은 부침개, '포시랍다'는 귀하게 자라 험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파이다'는 나쁘다는 뜻, '오그락지'는 무말랭이, '땡초'는 맵디매운 고추다. 이 말들을 떠올리면 해 질 녘 골목, 외할머니의 부엌, 시골 장터 냄새가 난다.
사투리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향토성이자 뿌리이며, 언어적 다양성이다. 물론 표준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적 자신감을 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지역의 말을 지운다는 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지우는 일과 같다.
다만 사투리를 쓰는 방식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캠페인에서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직설적 억양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지역민조차 생경하게 만들었고, 사투리 본연의 정서와도 어긋났다. 유희적 도구로만 소비되는 사투리는 결국 피상적 재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라지는 방언을 아쉬워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고, 버릴 건 버리자. 그러나 '대구말'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다. 사투리는 촌스러운 옛말이 아니다. 각 지방의 말에는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다. 사투리를 지킨다는 건 곧 지역의 정서와 삶의 온도를 함께 지키는 일이다.
갈수록 젊은 세대는 사투리를 모른다고 푸념할 게 아니라, 자연스레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 드라마, 문학 속에서 대구말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대구말이 단지 지역의 방언으로 사라지기엔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투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역시 필요하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지역의 역사와 따뜻함을 읽어야 한다. 서로 다른 말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언어문화를 가질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