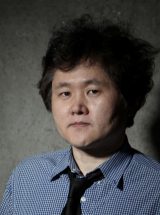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도시들은 저마다 고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별명을 붙여왔다. '사과의 도시', '섬유의 도시'를 지나 '컬러풀 대구', '파워풀 대구'가 등장했듯, 역사도시 경주 또한 오랫동안 '고분의 도시'라는 별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경주의 인상을 새롭게 한 것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목받은 신라 금관이다. 한미 정상이 금관 옆으로 나란히 선 장면은 금관이 지닌 상징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자연스레 질문이 이어졌다. 신라 금관은 왜 흩어졌으며, 그 속에는 어떤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의 성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서울·청주·경주에 나뉘어 있는 금관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요구, 20세기 초 발굴 과정의 허술함과 부정확한 기록, 심지어 민간인이 금관을 착용해 보았다는 기사까지. 금관은 천오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문화재 행정, 공공성,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경주 이전을 촉구하는 쪽은 금관이 경주의 흙 속에서 출토됐고, 왕릉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므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박물관이 구축해 온 보존 체계, 전국적 접근성을 고려한 분산 전시의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문화재의 이관은 보존 환경, 안전성, 연구 인프라, 접근성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다. 논쟁의 초점은 결국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로 옮겨간다.
그러나 장소 논쟁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금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이다. 금관은 과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였지만,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재인식되고 있다. 누군가는 금관에서 미적 가치와 기술적 정교함을, 또 누군가는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는 통합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갈등의 언어가 일상이 된 지금, 황금의 나라 통일신라가 지녔던 문화적 안정과 창조성은 천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흩어진 기억과 가치를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는가.
신라 금관은 더 이상 박물관 유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 땅의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황금의 나라 신라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문화 연속성을 다시 세우는 일. 지금이 그 오래된 꿈을 새롭게 그릴 때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르포] 구미 '기획 부도' 의혹 A사 회생?…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韓 소명 부족했고, 사과하면 끝날 일"…국힘 의총서 "당사자 결자해지"
위기 극복 실패 한동훈 리더십…당 안팎 책임 없는 태도 비판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