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신의 수이고 2가 피조물의 수라면 3은 2에서 야기된 쌍대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집결을 의미하는 수라고 한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1이 혼자서 세상을 생성하기에는 부족하여 2를 낳고 생명의 창출을 위하여 3으로 갔다고 하며 노자(老子)도 도(道)가 양(陽)을 낳고 양이 음(陰)을 낳아 이 3개의 개념이 세상을 생성한다고 했다.
수학자 실베스터는 3을 "모든 홀수의 으뜸이며,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가지는 최초의 수로서, 천국의 수"라고 했다.
시간에는 과거.현재.미래가 있고, 진동에는 파장.진폭.진동수가 있으며, 생명에는 생성.존재.소멸이 있듯이 3은 만물의 물성에 존재한다.
여러 종교에도 다양한 3신이 있다.
불교에 아미타물.약사여래불.관음불의 삼존불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 성자와 성부와 성신의 삼위일체가 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3의 절대성에 대한 완벽한 예가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신의 모습의 양면성은 수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상의 약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라는 제삼의 존재가 있어 삼위일체로 하나라 함에 이런 의문이 사라진다.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3개가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가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단테는 삼위일체의 이상을 싣고가는 수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의 '신곡'을 삼운구법(三韻句法)을 써서 구성했다고 한다.
4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수로 알려져 있다.
동서남북, 춘하추동 등 방위나 계절의 분류에서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의 분류에 이르기까지 문명화된 삶의 주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과정의 질서는 4가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 시인 쉴러는 그의 희곡 '피콜로미니'에서 "5는 인간의 영혼이다.
인간이 선과 악의 융합이듯이 5는 홀수와 짝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5는 남성(3)과 여성(2)이 결합된 사랑의 수인가 하면 사람의 삶과 연계된 수라고 한다.
오복(五福), 오행(五行), 오계(五戒), 오륜(五倫) 등 인간의 삶의 형태에 관한 개념을 분류하는 귀에 익은 말에서 5의 역할을 보게된다.
그런가하면 5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흔드는 불완전한 수로 인식되기도 한다.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으로 평면을 빈틈없이 붙일 수는 있지만 정오각형으로 붙일수는 없다.
이것이 5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예이다.
6의 약수 중 자신보다 작은 수는 1, 2, 3이다.
이 세 수의 합은 다시 6이된다.
수론에서는 이러한 수를 완전수라고 한다.
기하학적으로도 6은 점(1), 직선(2), 삼각형(3)의 총화를 나타낸다.
이런 뜻에서 기인하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6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수라고 한다.
6의 완전성은 종교 문화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체 중생이 필연적으로 거쳐야하는 6개의 윤회의 단계, 육도윤회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에서, 그리고 신이 6일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독교 문화에서 6의 완전성을 읽을 수 있다.
독일 베네딕트회 수도사 라바누스 마우루스는 심지어 "신이 6일만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6이 완전한 수인 것이 아니고 6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신이 6일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여 6의 완전성이 신의 완전성에 선행한다고 봤다.
이와 같이 수는 수학 안에서는 그저 수에 지나지 않지만 수학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철학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황석근(경북대 수학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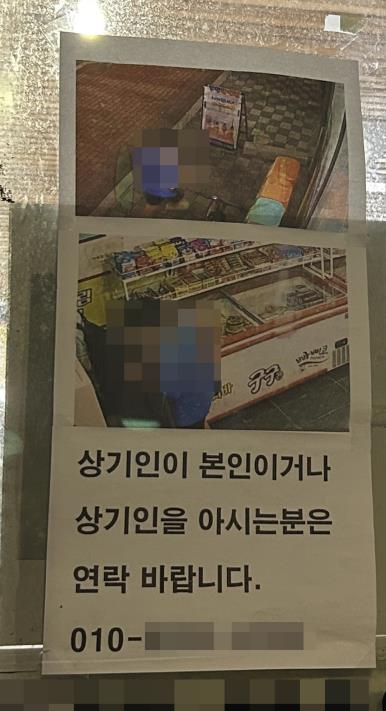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