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고대국가 건국 과정에서 족장출신이나 그의 가족들이 지배층이 됐다.
이들은 지배체제를 다지기 위해 다른 족장출신의 지배층과 연대해 피지배층을 억눌렀다.
족장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피지배층과 다르다고 믿었으며 귀족층이 지켜야 할 범절을 존중했다.
또 국가의 팽창과정에서 통합한 세력의 족장이나 왕족들 중 우대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귀족층에 포함했다.
족장층이 아니더라도 국왕의 측근 관리로서 귀족이 된 세력도 있었다.
▲중.하급 지배층=귀족은 아니지만 일반민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부류들이다.
이 계층의 주류는 고구려 백제의 5부나 신라의 6부 출신들이다.
귀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소족장들과 국가건설에 공헌을 한 일반인들도 이 계층에 포함됐다.
이들은 중앙의 행정관리, 군대의 중간 지휘자, 왕 측근의 호위병과 같은 핵심적 병사가 되거나 전문 관료층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의 귀족.관료와 구분되는 지방의 유력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지방관을 도와 세금을 걷거나 부역을 징발하고, 지방민으로 구성된 병사들을 지휘했다.
▲평민=대개 농민들로서 족장들의 지배를 받던 부족 공동체의 일반 구성원 출신이다.
농사를 비롯한 생업에 종사하며 남자들은 군대에 가고 부역을 하며 세금을 내야했다.
국가의 기초적인 존재였다.
여자들은 농사를 같이 짓고 길쌈을 하며 가사에 종사했다.
때로는 부역에 징발되기도 했다.
평민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많이 진 계층이었다.
노비와 달리 독자적인 생계를 영위했다.
또 공적인 의무를 지는 자유인이었다.
이들은 의식주에 대한 부담이나 세금을 낼 수 없어 빚을 지고 자녀를 팔기도 했다.
경제적 위상으로만 볼 때 노비보다 나은 측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비와 달리 타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노비=노비는 개인이나 국가 혹은 사원의 소유물이었다.
노비들은 주인을 위해 무상으로 봉사했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했다.
이 계층은 본래 전쟁의 포로로부터 나왔다.
포로는 이방족속인 만큼 한 사회에서 같은 성원으로 인격을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주인의 소유물로서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
전쟁포로 뿐만 아니라 범죄 노비도 존재했다.
또 세금을 내지 못한 자나 부채대신 자녀를 팔아 생긴 채무노비, 유괴되어 팔린 노비 등도 있었다.
▲골품제=삼국의 신분제 중 구체적 실상이 전하는 신라의 제도다.
골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등에 차이가 있었다.
신라의 관등은 모두 17등급으로, 최고 관등인 이벌찬에서 5등급인 대아찬까지는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6두품은 6등급인 아찬 이하의 관등에,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大奈麻) 이하,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 이하의 등급에만 오를 수 있었다.
골품에 따라 생활에서도 규제를 받았다.
입을 수 있는 옷감의 종류, 색깔도 제한을 받았다.
수레를 꾸미는 장식에도 골품에 따라 차등적 제한이 있었다.
그릇에도 제한이 있어 금은 왕실이외에는 사용치 못했다.
또 방의 크기, 담장 높이와 마구간의 크기도 골품의 차등에 따라 제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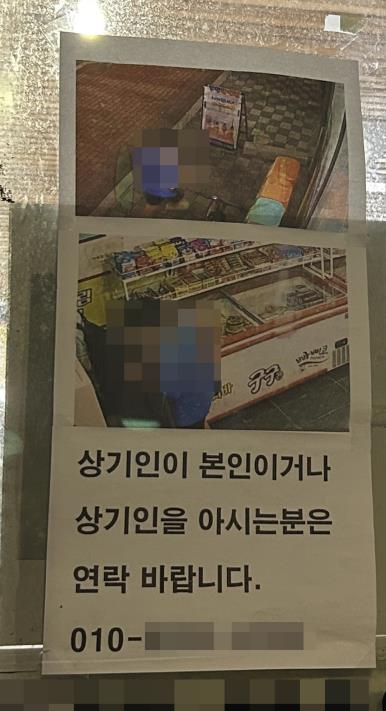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