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 시각에 숙소를 나온다.
골목에는 밤새 소들이 쏟아놓은 배설물이 흩어져 있다.
바라나시에선 소똥을 밟지 않고 길을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아침이 찾아든 강가로 향한다.
밤새 검은 화염을 피워 올리던 화장터도 조금씩 타다만 연기만 솟을 뿐 조용하다.
신성한 아침에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발의 노인이 젓는 보트를 빌려 강을 거스르며 사진을 몇 장 찍는다.
바라나시의 아침은 인도의 여타 지역보다 유난히 평화롭고 또 장엄하다.
아침해가 너른 강가와 가트 주위에 늘어선 오래된 건축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거나 신을 숭배하는 기도를 올린다.
붉은 성벽에 뿌리내린 보리수의 무성한 잎들이 바람에 자유롭게 흔들린다.
나는 인도인들처럼 강물에 몸을 씻기로 한다.
강가에 세 번 몸을 씻으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창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찬양해마지 않는 성스런 강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어서다.
그러나 강물은 그리 깨끗하지 못하다.
외려 더럽고 불결하기까지 하다.
갖가지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가 떠가고, 놀랍게도 돌을 매단 아이의 시체를 배에 싣고 와 강심에 던져 넣기도 한다.
강바닥은 몇 백년, 그 이상의 세월동안 시체를 태운 재들이 쌓여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뻘을 이루고 있다.
문득 발바닥에 와 닿은 길고 딱딱한 물체는 어쩌면 타다 남은 사람의 정강이뼈의 일부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건 마음에 기인하는 것(一切唯心條). 깨끗함과 불결함 역시 인식의 문제라 여기고 느긋하게 수영까지 즐긴다.
강 중앙에 불쑥 커다란 민물돌고래가 검은 등을 드러낸다.
뜻밖으로 물은 매끄럽고 시원하다.
이 갠지스강이 없었다면 인도는 태어나지 못했으리라. 강가는 생명이며 대지를 적시는 여신이다.
그리하여 강 자체가 신격화된 Gangamataji(어머니이신 강가)가 아닌가.
더운 오후 나절. 바라나시 시장에서 릭샤를 타고 십여km 떨어진 사르나트(녹야원:鹿野園)로 향한다.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다섯 제자에게 첫 설법(초전법륜:初轉法輪)을 행한 의미 깊은 곳이다.
왜 인도가 종교의 나라라고 하는지 알 듯해요.
곁에 앉아 있던 혜원이 말한다.
나는 그녀가 말한 의중을 짐작한다.
조금 전 시장골목에서 한동안 통행이 정체되어 몹시 혼잡스러웠다.
나중 겨우 길이 뚫렸고, 지나가면서 보니 검은 개 한 마리가 도로 중앙에서 자고 있었다.
잠든 개를 피해가려다 보니 통행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개를 깨우거나 도로에서 내쫓지 않았다.
그저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무심히 피해서 갈 뿐이다.
난 그 장면에서 인도인들이 가진 심성의 한 면을 읽었다.
바라나시의 도심 도로는 놀랄 만큼 통행량이 많다.
인도와 차도의 분간도 없는 비좁은 도로에서 소와 장사꾼과 행인들, 오토릭샤와 자전거, 택시, 수레, 지프, 트럭이 한데 뒤엉킨 채 도로를 메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무수한 벌떼가 잉잉대며 벌집으로 모여드는 광경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혼잡 속에서도 여간해선 다툼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새떼들이 허공에서 충돌하지 않고, 벌떼가 겹겹으로 많이 모여도 서로 밀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거리에서 릭샤와 트럭이, 택시와 자전거가, 행인과 오토바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가는 걸 보면 가히 곡예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도로에서는 누가 앞서가든 뒤에 오는 자의 길을 비켜놓고 있다.
속도가 빠른 오토릭샤는 안쪽을 달리고, 느린 사이클릭샤는 바깥쪽을 통행한다.
차선이 없어도, 신호등이 없이도 이런 무언의 약속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행된다.
만일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 길이 막히거나 서로 슬쩍 부딪혀도 그뿐이다.
아무도 화를 내며 따지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어쩌면 그건 마음의 악의(惡意)를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나만 먼저 가겠다는 그릇된 이기심, 나만 바쁘다는 조급한 경쟁심, 나만 잘했다는 편견을 버릴 때 가능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설혹 서로 부딪혀도 책임과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관용의 자세가 그 바탕일 것이다.
그건 사회적 제도와 자연적 질서와의 차이가 아닐까. 선(線)과 신호로 이루어진 사회적 질서는 법이라는 타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타율적 규제를 속이고 어기려는 자가 생겨난다.
남을 이기려는 경쟁심 때문에 탈법과 불법, 범법이 판을 친다.
반면에 마음속에 자연스레 자리한 양보심과 이해와 관용은 결코 어떤 상태에서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자연처럼 운용될 뿐이다.
문득 공자의 예기(禮記)에 실린 말이 떠오른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하면 사람들은 그 법망을 뚫을 궁리를 하게 되므로 예로써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가.
상념에 잠긴 사이 저 멀리로 붉은 스투파(Stupa: 불탑)가 나타난다.
자주색 가사를 걸친 라마승들과 유럽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의 무리가 눈에 띈다.
나는 천천히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石柱)와 다메크(Dhamekh) 스투파를 둘러본 뒤 그녀와 함께 가까운 노변의 가게로 간다.
점심시간을 넘겨 허기가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한 평도 되지 않는 가게에 먹을 거라곤 시커먼 기름에 튀겨낸 사모사와 달기만 한 인도 과자, 스낵과 비스킷 종류, 먼지 낀 병에 든 콜라와 주스, 레몬소다 따위뿐이다.
더운 날씨임에도 비스킷 포장지에는 제조일자조차 찍혀 있지 않다.
왜 유효날짜가 찍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젊은 주인남자는 베텔(Betel)을 씹은, 피처럼 붉은 침을 땅바닥에 뱉고는 '노 플라브럼'이라고 말한다.
아무 문제없다는, 인도에서 흔히 듣게 되는 낙천적인 대답이다.
그녀와 나는 오렌지와 바나나를 몇 개 사먹는 걸로 점심을 대신한다.
부처도 식중독으로 열반에 들었으니 나 같은 소인은 더욱 식중독을 조심해야 할 거라며.사진: 옛날 승원이 있던 자리를 둘러보는 티베트 승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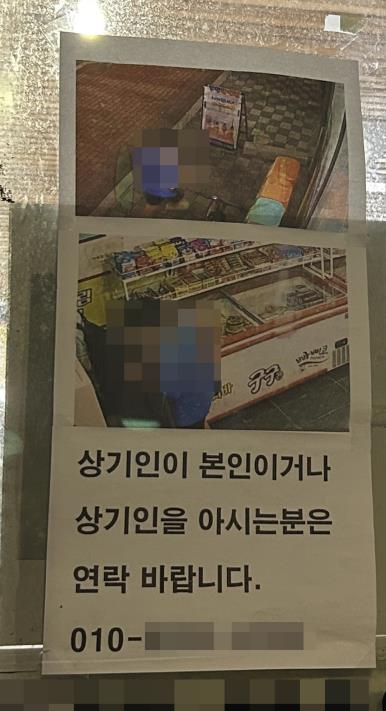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