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 지수는 자살소동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다.
자축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 손목 동맥을 자른 것이다.
그녀의 병명은 '경계성 성격장애'이다.
주치의였던 정신과의사 석원은 병원을 사직하면서, 지수를 다른 의사에게 인계한다.
재차 버림받았다고 느낀 지수는 치료를 중단해 버린다.
그로부터 1년 뒤, 우연히 석원과 지수는 재회한다.
지수의 분노발작과 방황을 안타깝게 여긴 석원은 지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다.
그러나 지수는 치료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친구로 지내길 원한다.
석원은 지수에게 최면을 유도한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사랑했던 남자와의 정사 장면을 회상하며 신음하는 지수에게 강열한 욕정을 느낀 석원은 그녀를 범하고 만다.
이것이 석원에겐 시작에 불과했으나, 지수는 마지막임을 고한다.
석원이 1년 전 지수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고 홀연히 떠나버린 것처럼, 지수는 석원을 먼저 떠남으로써 복수하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석원은 지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최면을 걸어서라도 그녀를 붙들려고 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녀를 향한 집착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날도 석원의 전화를 받은 지수는 홀린 듯 진료실을 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시신의 일부가 수습되지 못할 만큼 참혹한 죽음이었다.
그녀의 소식을 접한 석원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그때 온통 망가진 기괴한 모습의 지수가 나타난다.
극도의 공포감으로 헤매던 석원은 25층에서 추락사한다.
주인공 지수의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애가 신경증과 정신증의 중간 정도에 놓여 있어서 '경계성'이란 용어를 쓴다.
일반인의 2%, 정신과 외래환자의 10%, 입원환자의 20%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며, 이 가운데 75%는 여자다.
이 병은 정서, 대인관계 및 자아상에서 불안정성과 충동성이 특징이며, 초기 성인기에 시작된다.
상대방을 천사 같은 지지자로 보다가도, 순식간에 잔인한 처벌자로 보는 등 극단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
이들은 사람보다는 인형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
정체감의 혼란으로 직업이 자주 바뀌고, 졸업 직전에 자퇴하거나, 치료가 잘 되어간다는 말을 들은 후에 심하게 퇴행하는 등 인생의 목표가 실현되기 직전에 자신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치료는 일상에서 겪는 대인 관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치료를 실시하고,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동반된 문제를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최면요법은 치료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경과는 상당히 다양하여, 초기 성인기에 가장 불안정하고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으며 30, 40대에 이르면 대부분은 현저히 안정된다.
개인의 정체감의 혼란은 개인의 고통을 초래하나, 사회가 안고 있는 정체감의 혼란은 이 시대의 우울을 야기한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사회도 경계성 성격장애 상태는 아닐까. 마음과 마음정신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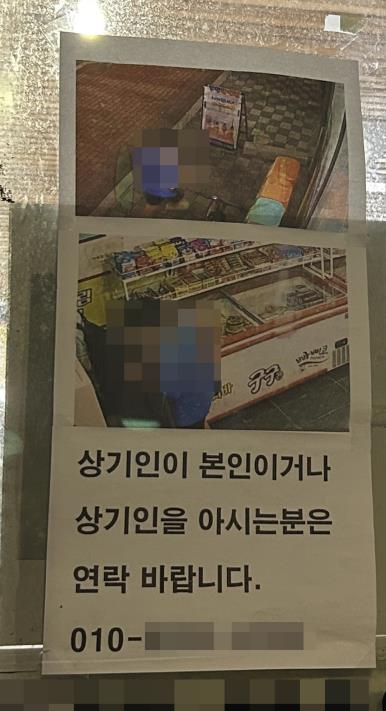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