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성구 수성4가동 옛 (주)코오롱 대구공장 자리에 근린공원이 들어섰다.
그러나 사실 당초 이곳에는 섬유도시 대구에 걸맞은 '섬유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물관은 없고 왜 공원이 들어섰을까. 사연이 길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곳의 변화를 보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桑田碧海)'는 옛말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
(주)코오롱 대구공장은 코오롱그룹의 모체인 한국나이론(주)이 지난 1957년 수성구 수성4가동 1090의1에 자리를 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3만5천여평의 공장은 1993년 12월 문을 닫고 경북 김천으로 옮기면서 36년간의 대구시대를 마감했다.
그뒤 이곳에는 고층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 96년부터 99년까지 2천479가구의 시민들이 새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옛 공장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섬유박물관 건립계획이 세워지고, 당시의 대구시장이 아파트신축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등 공무원들이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에 불려다녔던 한 공무원은 "이곳 문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몸서리쳤다.
당시 코오롱 측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주거지역인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줄 경우 전체부지 가운데 1만여평에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섬유박물관 및 문화센터 등 시설을 짓겠다면서 지난 1993년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법상 불가능한 일. 이 때문에 대구시는 섬유박물관 건립 등 코오롱 측의 약속을 믿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는 분할돼 주택회사들에 팔렸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회사 측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 주거지역보다 용적률 적용이 유리해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은 꼬였다.
회사 측이 박물관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던 땅 1만여평을 쪼개 3천100여평만 남기고 주택업체에 팔았다.
나머지 땅도 다시 나눠 1천600여평은 주택회사에 넘기고 1천500평만 남겼다.
시민을 위한 시설 등으로 약속한 1만평이 1천500평으로 쪼그라든 것.
이 때문에 대구시와 코오롱,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 사이에는 수년 동안 갈등이 빚어졌고 지역사회는 한 대기업체의 약속위반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코오롱 측은 남은 1천500평을 시에 넘기고 두류공원 내 야외음악당을 지어주기로 시와 합의했다.
시는 3억원을 들여 올 4월 공원조성에 들어가 지난달 4일 준공했다.
음악당도 코오롱 측이 200억원을 들여 2000년 문을 열었다.
10년간의 '코오롱사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섬유도시 대구에 세워질뻔 했던 섬유박물관은 그렇게 운명이 바뀌게 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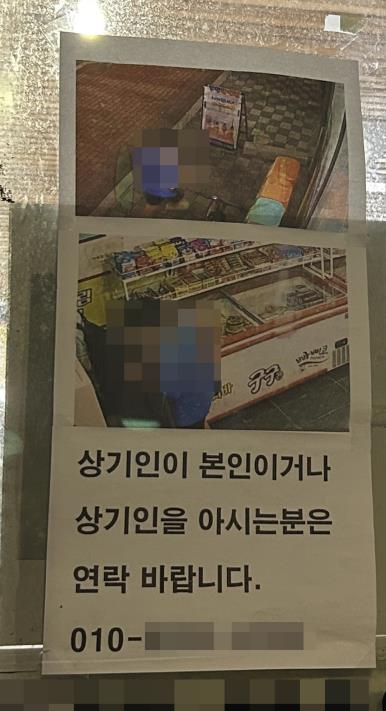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