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있을까. 뉴턴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근간으로 하는 고전 물리학은 자연계 현상의 절대 법칙을 추구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던 고전 물리학의 명제들은 20세기 초 상대성 이론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종말을 맞았다.
이제 물리학계에서 더 이상 절대 불변의 진리가 존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오직 가능성이 높은 확률만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질되어 왔는가를 역사적 시점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저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상도 고정불변된 것이 없고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 학문적 권위· 정치권력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변질, 왜곡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상가의 언행이나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출생 환경, 성장 과정, 당대의 정치·문화·사회적 배경, 주변 인물들의 해석과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사대부의 개념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사대부는 한대 이후 세습에 의해 권력과 위신을 유지한 관료층을 일컫는 용어에서 송(宋)대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선우후락'(先憂後樂-남들보다 앞서 근심하고 남들보다 늦게 즐거워하라)을 이상으로 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진 지적 엘리트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주자학과 양명학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상이라는 주장도 반박한다.
주자학을 정부의 어용학문으로 양명학을 민중사상으로 파악하는 근현대의 평가는 잘못이며 양명학은 주자학의 연장된 형태라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두 학문이 외관상 달리 보이는 것은 주희와 왕수인의 성격·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 주희의 정미(精微)하고 분석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 태도는 주류파에 대한 대항 의식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임에 틀림 없으므로 양명학의 민중적 입장을 본질인 양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철학적 용어가 된 '기'와 '리'도 당시 사람들은 학문적 소양 없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일상 용어라고 주장한다.
주자학이 정착되면서 세계의 원리이자 진리라는 의미가 부여돼 철학 용어가 되었다는 것.
책 후반으로 접어 들면서 저자는 동아시아 근세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중국의 근세를 당·송 변혁 이후로 규정하고 근거로 사대부가 주축이 된 정치문화의 성립을 꼽았다.
근세는 주자학의 시대였으며 주자학은 송대에 보급되기 시작한 인쇄기술에 힘입어 서적과 갖가지 안내서 형태로 확산되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0세기 말 동아시아 사람들의 의식이 본격적으로 동요했다고 보고 있다.
고도로 성장한 경제와 그에 따른 격렬한 사회 유동화 현상은 전통적인 사회질서나 인간관계의 양상을 바꿔 놓았으며 인터넷의 발달은 일찍이 인쇄술이 발달했던 때와 비슷한 크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 저자는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맞는 상황은 중국으로 주자학이 등장했던 무렵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주자학을 공부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데도 힌트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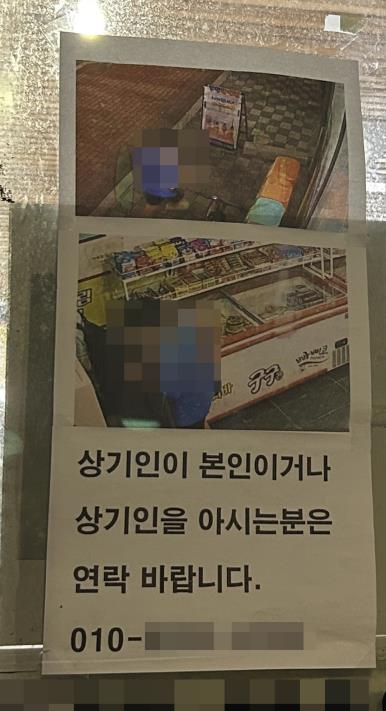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