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행 BIS비율이 얼마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 촌로(村老)가 예금하러 들른 은행 창구 직원에게 던졌다는 질문이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BIS비율이란 게 높아야 내 돈 떼일 걱정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이렇듯 외환위기는 국민의 경제 지식 수준을 높여줬다. 그렇게 얻게 된 경제 지식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있다. 사실 외환위기 전에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늘날만큼 크지 않았다. 1984년까지 신용평가사에 의해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12개 선진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중남미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신용평가 수요는 급속히 늘어났고, 더불어 이들의 힘도 무소불위가 됐다. 무디스의 경우 평가 대상은 국가신용도를 포함해 기업, 금융기관, 유가증권, 지방자치단체 등 13만여 종이 넘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자금은 전 세계 국채 자금시장의 40%인 20조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신용평가가 전혀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2001년과 2002년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미국 엔론사와 월드컴에 대해 무디스는 파산 4일 전까지도 '투자 적격'을 유지했다. 2003년 세계적 낙농업체인 이탈리아의 파르말라트 파산 때도 무디스와 피치는 내부평가를 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때는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에 대부분 AAA등급을 매겨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 모두 신용평가사와 평가 대상 간의 '야합'의 결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S&P가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떨어뜨리자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사를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박수를 보내면서도 잘될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1998년 일본도 무디스가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자 '역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해프닝으로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개 민간 신용평가사의 펜 끝에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모순된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U의 선언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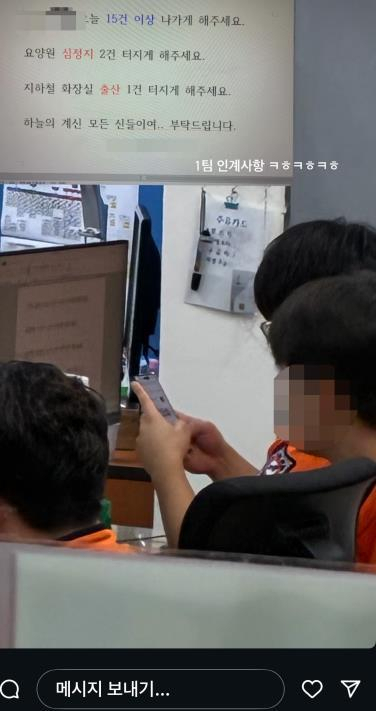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