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떠나고 싶은 것은 계절 탓일까. 평일이라 한산한 고속도로를 2시간여 달리니 새재 주차장이다. 양쪽 길가에 마련된 사과축제 부스는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로 온통 빨갛다. 제1관문인 주흘관 성벽 위에 깃발들이 줄지어 펄럭인다.
조선 태종 때 길이 열린 새재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 중 가장 높고 험한 고개다. 나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새재. 옛날 과거길의 영남 선비들이 남쪽의 추풍령과 북쪽의 죽령을 두고 굳이 험준한 새재를 택했던 것은 추풍낙엽 될까 두렵고 미끄러질까 겁났기 때문이란다. 조선시대 관리의 절반이 영남 출신이었다니 새재에 서린 그들의 사연과 애환이 얼마나 많았을까. 1904년 경부선 철도가 놓이고 1925년 인근의 이화령에 3번 국도가 지나면서 새재는 옛길이 되었고 이화령에 터널이 생기면서 이화령 또한 옛길이 되었다. 이제 다시 사람들이 새재를 찾으니 깊은 산중에도 흥망은 있나 보다. 계곡 맑은 물 위에 가랑잎이 한가롭게 떠가고, 물속 버들치, 갈겨니는 여유롭게 헤엄치고, 푸른 하늘엔 흰 구름 한두 점이 무심하게 흘러간다. 뒤따르는 다람쥐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산매미는 가을바람이 야속한 듯 처연히 울어댄다.
한참을 올라 만난 국영여관 조령원 터에는 돌담 안에 초막 하나만 덩그렇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사람과 말은 지치고 밤짐승마저 울어대는 곳에서 옛 선비는 이곳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인근 주막. 주모의 눈웃음에 과거길을 잊고 노잣돈을 탕진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간 선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주모도 선비도 없는 텅 빈 주막에 가을 바람만 소슬하다.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다는 계곡 아래 용담 너럭바위에는 최후를 맞는 궁예의 마지막 독백이 허공을 맴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정말이지 우리네는 왜 이리 욕심을 부리는지. 제2관 조곡관을 지나면 길가에 새재아리랑비가 서 있다. '문경새재 물박달나무/ 홍두깨로 다 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홍두깨 방망이 팔자 좋아/ 큰아기 손질에 놀아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문경새재 넘어를 갈제 굽이야 굽이야 눈물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큰아기 손질에 놀아나던 홍두깨방망이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걸음을 재촉하여 새재 정상에 오르니 제3관문인 조령관이 우람하다. '꾸불꾸불 새재길 양장 같은 길/ 지친 말 부들부들 쓰러질 듯 오르네/ 길가는 이 우리를 나무라지 마시게/ 고갯마루 올라서서 고향 보려 함일세.' 바위에 새겨진 서거정의 '대구 어버이 뵈러 가는 길에 새재를 넘으며'를 읽고 눈 들어 먼 하늘을 바라다보니 어머님 계시는 내 고향 대구가 실제로 보이는 듯하다.
임주현(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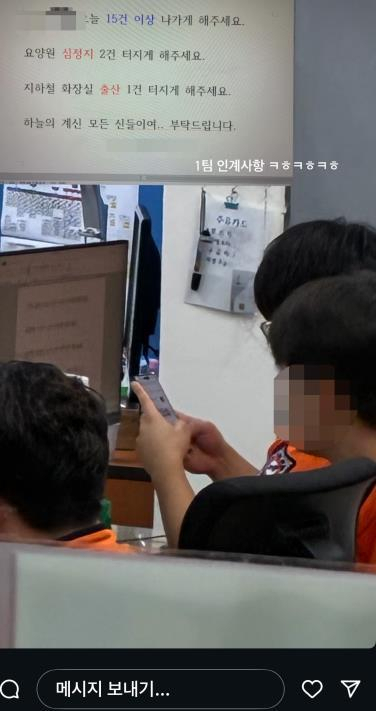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