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문 나무 그늘에 낙타가 앉아 있다
모자 하나 곁에 놓아두지 않고
오수 또는 유유자적이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앉아서 입적한 선승을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
출가도 가출도 아닌
자본주의 옆구리
주거부정의 그늘 한 자락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저 자리
오직 앉아있음(只管打坐)을 수행하고 있다
집도 신도 깨달음도 버리라지만
처음부터 버릴 것이 없으니 무엇을 더 버리나
어깨에 쓴 넝마를 살며시 곁에다 내려놓는다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오직 앉아있음"뿐일 때가 있다. 이
때 앉아있음이란, 거의 "죽은 것"에 다름없는 상태가 아닐까 한다. 대학 후문 나무 그늘에 낙타처럼 퍼질러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오갈 데 없는 저 부랑자는, 말하자면 "출가도 가출도 아닌/ 자본주의 옆구리/ 주거부정의 그늘 한 자락"인 셈이다.
그는 가진 거라곤 도무지 없어서, 흔한 "모자 하나 곁에 놓아두지 않"은 적빈의 빈손이다. 그 '빈손'이 보는 이로 하여금 '좌탈입망(坐脫立亡)'의 지경에 든 선승의 초탈을 느끼게 할 정도였으니, 시쳇말로 '제대로' 비워낸 경지가 아닌가 한다.
사노라면 누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할 때가 있다. '백천간두 진일보'의 지경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버려야만 저 '진일보'의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정히 버릴 것이 없으면, 저 주거부정의 부랑자처럼 "어깨에 쓴 넝마"라도 "살며시 곁에다 내려놓"아야 한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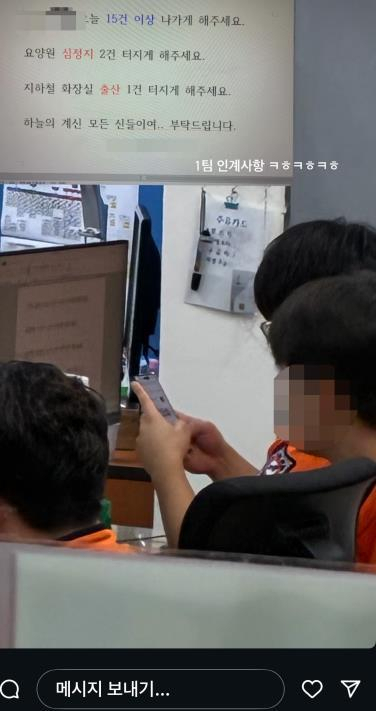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