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자도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풍랑이 거세 바다는 텅 비어 있었다. 부두가 있는 하추자에서 상추자로 가는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우산이 별 필요가 없었다. 이곳 추자도의 비는 수직으로 내리지 않는다.
면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골목을 누벼 찾아간 궁궐민박(064-742-3832)은 정말 궁궐다웠다. 주인집은 골목의 남쪽에 있었고 손님을 받는 민박 건물은 맞은편 언덕 위에 있었다.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유럽의 산꼭대기에 있는 성에 오른 기분이었다. "스위치만 올리면 방은 이내 따뜻해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고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
##비바람에 고깃배 묶여 생선 구경도 못해
우리 일행은 4박 5일 여정 중에서 부산-제주 간 페리호에서 일박, 제주 도두동 민박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추자도가 삼일째인 셈이다. 이번 음식여행 구간 중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추자도가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있으니 당첨을 꿈꾸며 손톱으로 긁은 복권이 '꽝!'으로 터져버린 것 같았다.
기우는 곧 닥쳐올 상황을 미래가 보내 오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부둣가 식당마다 수족관은 비어 있었다. "배가 바다에 못 나간 지 벌써 닷새째예유." 가장 이름난 횟집의 수족관에도 '히라스'(방어의 일종) 몇 마리가 헤엄칠 기운도 없이 목침도 베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일행 중 누가 "이럴 바에야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이나 먹자"고 제의했다. 감성돔 낚시의 천국인 추자에 와서 생선회 한 조각도 맛보지 못하고 단무지를 춘장에 찍어 먹을 생각을 하니 비오는 날씨만큼이나 서글펐다. 세상에! 추자도의 밤을 자장면으로 때워야 하다니. 자장면 건더기를 안주로 배갈을 시켰다. 주인 여자도 웃었다. "비올 때는 그냥 아무 거나 잡숴요." 웃으며 말하는 안주인의 인심이 꽤 괜찮아 보여 삼만원짜리 삼선잡탕 안주를 시켰다. 바다에 풍랑이 치면 추자도 중국집의 안주 접시에도 비바람이 부는지 싱싱한 생선은 한 토막도 보이질 않았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T. S. 엘리엇의 시) 바람 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낼 수는 없는가. 그날 추자도는 4월의 황무지처럼 잔인했다.
##이십 수년 전에도 초라한 밥상만 마주해
이십 수년 전에 추자도에 갯바위 낚시를 온 적이 있었다. 바위틈에 붙어 앉아 자정 넘어까지 물결에 일렁이는 전자찌만 바라보았지만 셋이서 겨우 잡은 것이 잿방어 한 마리였다. 새벽녘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 민박집 아침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옆방의 프로 낚시꾼들은 저네들이 잡은 '감생이'(감성돔)로 회를 쳐서 푸짐하게 한상 차려 먹고 마시는데 우리 밥상은 너무나 초라했다. "우리도 회 한 접시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저분들이 낚시로 잡아온 거예요"란 실망스런 대답만 돌아왔다. '음식 끝에 맘 상한다'는 옛말은 진실이다.
##허드레 통에 던져진 조기로 찌개 끓여
다음날 아침 추자의 하늘은 닷새 동안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활짝 갰다. 공기는 정말 상쾌했다. 도시의 코가 꿩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공기가 흐르는 쪽으로 실룩거리며 따라다녔다. 부두로 나갔더니 먼 바다로 나갔던 조기잡이 배 한 척이 비바람 뱃길을 뚫고 돌아와 짐을 부리고 있었다. 어판장에는 아낙네들이 선별 작업을 하느라 손놀림이 바빴다. 그물에 끼어 대가리가 떨어져 나갔거나 상처난 조기들은 정품 상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드레 통에 던져졌다.
"추자도에 와서 생선 구경을 못 했어요. 맛 좀 보게 조금만 팔아요." "야야, 기리빠시 팔아라 카네." 우린 단돈 만원을 주고 큰 비닐봉지가 두둑할 정도의 황금색 참조기를 담아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민박집 아주머니도 "횡재하셨네요"라고 입 부조를 한다. "점심때 조기 찌개나 잘 끓여 주세요." "우리 집 아저씨도 배로 민어랑 농어를 잡아 택배로 보내 줄 수 있는데요." "대구에 가서 우리도 민어 주문할 게요." 그날 먹었던 참조기 찌개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필설난기(筆舌難記)의 맛이었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정말 맛있었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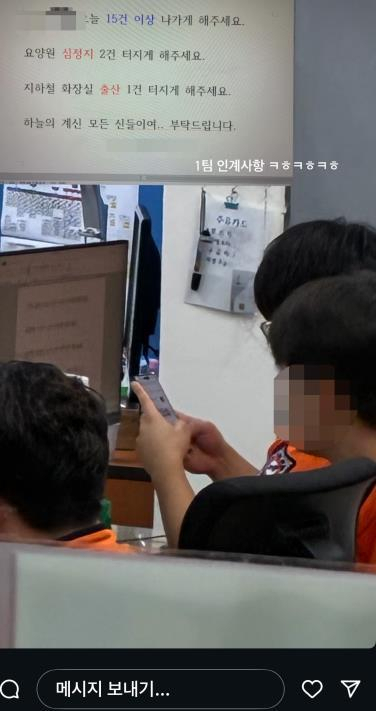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