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경북대 자연계열과목 수업시간. 출석 체크가 끝나자마자 몇몇 학생들은 가방을 들고 잽싸게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등록 수강인원은 57명이지만 자리를 메운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했다.
이 수업은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만 진행하는 강의다. 학생들은 교실 앞줄은 비워둔 채 모두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 노트북을 켜고 웹서핑을 하는 학생, 친구와 잡담을 하는 학생 등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교수가 "질문 있나요?"하고 영어로 묻자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떨어진 좌석만큼이나 교수와 학생 사이의 소통 거리도 멀어 보였다.
◆이해 불가, 그래도 듣는 학생들
이날 강의실에서 만난 K(25) 씨는 "이 과목은 한국어로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똑같은 과목으로 한국어 강의가 개설돼 있지만 학생들이 일부러 영어 강의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절대 평가'여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K 씨는 "지난 학기에 같은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는데 10문제 중 1문제를 풀어도 'A'가 나왔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 지난 학기에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도,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다. 4일 오후 영남대 A과목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환율 변동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며 "질문 있느냐"고 물었지만 학생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무늬만 영어 강의도 속출하고 있다. 영남대 B과의 한 전공 수업은 영어로 수업하긴 하지만 시험은 한글로 치러도 무방하다.
모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 학생들은 영어를 암기하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않다. 경북대 대학원생 정민수(가명·29) 씨는 꼭 필요한 전공 수업이라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의를 듣고 있다. 정 씨는 "학업에 꼭 필요한 수업인데 영어 강의밖에 개설돼 있지 않다"며 "교수님은 '대학원생이라면 이 정도는 영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푸념했다.
때문에 교수들은 학생들의 영어 향상 노력이 없다면 영어 강의는 '해악'이라고 말한다. 영남대 생물학과 유시욱 교수는 "전공 지식을 영어로 전달하다보니 어려운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영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한국어 강의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영어 강의를 듣는 현실에 대해 유 교수는 "절대 평가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어 강의 많다고 '글로벌 대학?'
대학이 영어 강의에 목을 매는 것은 영어 강의가 대학 경쟁력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 세계적으로 더 타임스지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진행하는 '세계대학평가(Times Higher World University Rankings)나 한국 언론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평가 순위에서 영어 강의나 외국인 교수 비율이 주요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평가에 민감한 일부 대학은 영어 강의 수를 부풀리거나 영어 강의 비율 공개를 거부하기도 한다. 영어 강의 비율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의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탓이다. 실제 영남대의 경우 "민감한 자료다.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영어 강의 수와 국제화 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중국인 C(23·여) 씨는 일부러 영어 강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 학기 '한국 문화' 수업을 수강한 C 씨는 "교수님은 수업 전 '미국에서 공부한 지 12년이 지나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며 "교수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어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영남대 교환학생 쥬디스 움 둠보(22·여·프랑스) 씨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나는 영어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국식 영어'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온 영남대 교환학생 탕 쿼이 텅(22) 씨의 눈에 비친 교수와 한국 학생 사이의 '영어 격차'는 더 심각한 문제다. 탕 씨는 "홍콩의 대학은 대부분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교수와 학생 모두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한국은 교수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학생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외국인 교수들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공 과목의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 강의에 몰입하는 세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스티브 게리거스 교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지만 영어가 수업 이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교수들의 강의 준비가 균형을 맞출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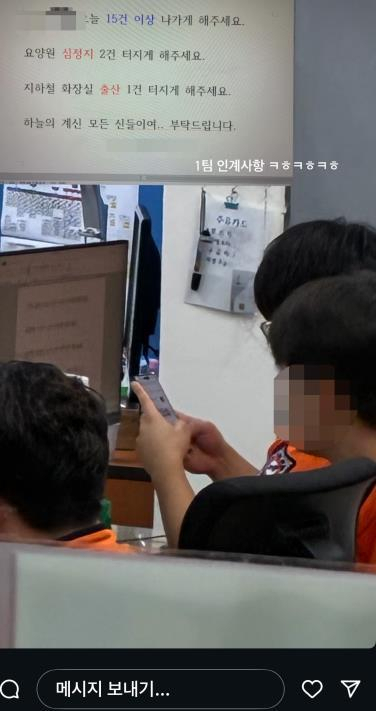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