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전한다.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의 김제상이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으로 등장한다. 물론 두 책에 대동소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다. 그중 한 가지가 선덕여왕과 모란꽃 그림에 관한 일화이다.
선덕이 부왕 진평왕을 모시는 덕만공주로 있을 때 일이다.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보내왔다. 당시 신라에는 모란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림을 보고도 그 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진평왕이 그림을 덕만공주에게 보이자 그녀가 말한다.
"이 꽃은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진평왕이 어찌 그것을 장담하느냐고 묻자 공주가 대답한다.
"그림에 꽃만 그려져 있고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대체로 여자에게 미모가 있으면 남자가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꽃들은 매우 아름다운데도 벌도 나비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일화는 백제군의 암습을 격퇴한 여근곡 전설,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사천왕사 도리천 설화와 함께 선덕여왕의 총명함을 증언하는 사례로 흔히 거론된다. 하지만 모란꽃 그림 이야기에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양식을 말해주는 가르침도 깃들어 있다.
벌과 나비는 실익을 보고 꽃을 찾는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만물의 영장답게 사람은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어도 꽃을 찾는다. 모란이 향기가 없어도 화가들이 그 꽃을 그림으로 그리는 까닭 또한 마찬가지이다. 꽃은 곧 예술적 삶의 상징인 것이다.
빌라 출입구 옆 한 평 남짓한 자투리땅이 애처로워 초봄에 누군가가 거기 봉숭아 꽃씨를 심었다. 덕분에 자투리땅은 붉은 꽃, 분홍 꽃, 하얀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 한창 보기 좋은 눈요깃감으로 바뀌었다. 아침저녁이 다르고, 어제오늘이 다른 소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나는 꽃씨를 심은 이와 자연의 섭리에 감사한다.
그런데 봉숭아꽃이 만발한 지 열흘도 넘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이가 별로 없다. 초등학교 교문 앞이건만 아이들마저 무심하다. 봉숭아꽃 잎으로 손톱 물을 들이는 등 예술적 삶을 살았던 옛날이 지금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던가? 요즘은 꽃이 피어도 사람이 찾지 않는 시대, 예술의 향기가 부족한 척박 사회인가?
봉숭아꽃 둘레에 사람은 없고, 벌만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닌다. 나는 혼자 서서 봉숭아꽃을 바라본다. '울 밑에 핀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노래가 저절로 떠오른다.
대구미술광장 입주화가 gogoyonji@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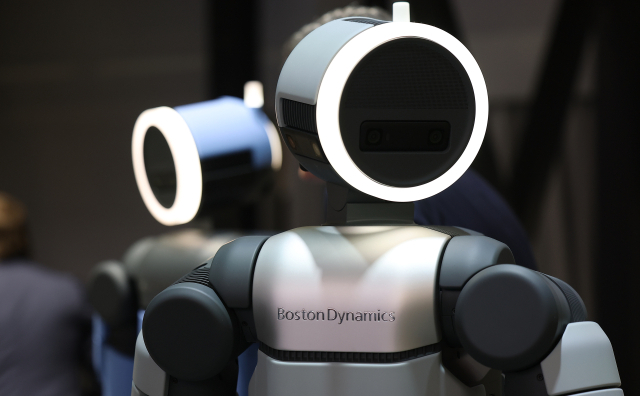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단식' 장동혁 만나 "목숨 건 투쟁, 국민들 알아주실 것"
한덕수 내란 재판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12·3계엄=내란"[영상]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비 배포?…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李대통령 "이혜훈, '보좌관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李대통령, 또 이학재 저격?…"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제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