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도시 회령(會寧)은 두만강 건너 삼합(三合) 지역과 오랑캐령(兀良哈嶺)을 거쳐 드넓은 북간도 용정 벌로 통하는 관문이자 이주통로였습니다.
돌아가는 배 그림자 물속에 어리어/ 삐걱삐걱 노 소리에 한숨이 찼다/ 강바람에 실어오는 호궁 소리는/ 천천히 배 띄워도 눈물 뿌린다('국경의 뱃사공' 1절)
눈물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새고 나니/ 압록강 푸른 물이 창밖에 구비친다/ 달리는 국경열차 뿜어내는 연기 속에/ 아아아아 어린다 떠오른다 못 잊을 옛 사랑이('국경열차' 1절)
송달협은 1940년에 만들어졌던 빅타레코드사 직속의 공연단체인 반도악극좌(半島樂劇座)에 참여했고, 이듬해에는 오케레코드 전속으로 되돌아와 두어 장의 음반을 내는 한편 주로 조선악극단(朝鮮樂劇團) 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케레코드사 대표이던 이철이 중국 상하이에서 돌연히 객사를 한 뒤에 조선악극단에 참여하던 여러 가수들이 하나둘씩 조직을 떠날 때에도 송달협은 끝까지 남아서 악극단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극단 공연에 쏟았던 송달협의 정성과 애착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새별악극단, 빅터가극단 등에서 악극활동에 대한 애정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백조가극단, K.P.K악단 등을 비롯한 여러 공연단체와 무대에서 송달협은 악극활동에 대한 자신의 집념을 펼쳐갔습니다. 돌이켜 보노라면 악극단 공연의 의미와 존재성이야말로 오늘날 뮤지컬 무대의 초창기적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송달협의 이름은 1950년대의 여러 극장공연 포스터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를테면 1955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공연되었던 계림극장 쇼 무대, 그리고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의 네 군데 대표적인 극장에서 펼쳐졌던 '호화선 태평양' 합동공연 광고지에서도 송달협의 낯익은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 피란시절에는 가요작품 '꿈에 본 내 고향'이 박두환 작사, 김기태 작곡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맨 먼저 악극단 공연무대에서 활동하던 송달협에게 먼저 부르도록 했습니다. 송달협이 이 노래를 부르면 극장 안은 여기저기서 온통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실향민의 애절한 향수와 이산의 슬픔을 절절하게 다룬 이 노래는 무슨 까닭인지 평양 출신 가수 한정무의 목소리로 도미도레코드사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극장무대에만 주로 출연하던 송달협의 삶은 볼품없이 시들었고 생기마저 잃어갔습니다. 그 까닭은 송달협이 광복 이후 악극단 공연을 다니던 중에 몰래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심각한 중독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주변 선후배들로부터도 자주 멸시와 냉대를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삶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오케음악무용연구소의 한 생도 출신 처녀와 사랑을 맺었고, 1946년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그 아이가 자라서 가수가 되었는데 1960년대 중반 팝송가수로 활동했던 송영란(宋暎蘭)이 바로 송달협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가수 윤복희(尹福姬)가 어린 시절,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송영란의 집에서 기거를 했었는데 이때 송달협의 부인은 두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투 스쿼럴스'란 이름의 소녀듀엣으로 서울 남산의 UN센터 무대에 출연을 시켰고, 나중에는 미8군 쇼 무대로까지 진출을 시켰습니다. 모녀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고달프게 살아온 송달협의 일생은 그야말로 이리저리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포기 부평초와도 같았습니다. 아편중독자가 되어서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혼자서 쓸쓸하게 거리를 떠돌던 송달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동순(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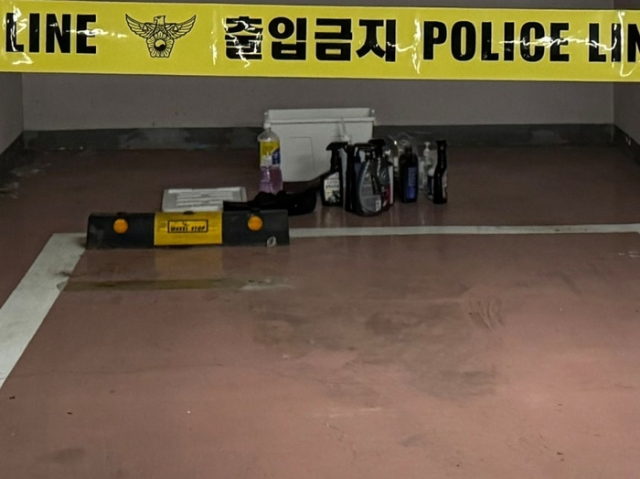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