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 먹으러 안 와?"
아침에 나간 아들이 저녁까지 소식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친구들이랑 먹고 갈게요. 27일에 수능시험 성적표가 나온다고 해서 위로 좀 해주려고요."
아들의 답장을 읽으며, 우습기도 하고 살짝 '같잖다'는 생각도 들어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하긴, 가채점으로 대강의 성적을 예상하고 있을지라도 내 눈으로 성적표를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조마조마 떨리는 게 수험생과 그 부모들 심정이다. 시험을 잘 봐서 날아갈 것 같은 아이들보다야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한 아이들이 언제나 더 많고, 속상한 아이들한테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멀리 보고 넓게 보아라, 결과를 수굿이 받아들이건 재수를 하건 간에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등등.
내가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썩소'를 지은 것은, 아들이 제 친구들과 달리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 할 때 킥복싱 도장을 다니고, 친구들이 여름방학 보충수업 다닐 때 대학생들이나 가는 '내일로' 여행을 다녀온 녀석인 것이다. 이번에 청룡영화제 작품상을 탄 영화 '소원' 촬영 당시 조명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아들은 이른바 '탈학교 청소년'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말썽을 부리지는 않는다. 좀 덜렁거리고 근성이 모자랄 따름이지, 고민이 굉장히 많거나 반항심이 충만한 아이도 아니다. 아이의 반항심이라야, 명문대 나온 부모한테서 났으니 부모 닮았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와 압박이 싫어, 일부러 공부에서 손을 놓는 정도였다.
어쨌든 아들은 지난해 고2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뒀다. 대한민국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고3'으로 살기가 싫단다.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그 힘든 고3을 견뎌봤자 어차피 관련 학과에 입학할 성적을 못 받을 거다, 재수는 더더구나 하기 싫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검정고시를 본 후 외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나가서 무엇이 됐든 몸으로 부딪쳐 보겠다고 했다. 부모 된 입장에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은 녀석이 제 인생 살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다.
아들은 올 4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봤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던 중, 국내에 조종과가 있는 항공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여 5월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몸을 튼튼히 하겠다고 킥복싱을 배우더니 전국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오는가 하면, 아르바이트 월급 받았다며 엄마'아빠 커플 운동화도 사다 줬다.
제 딴에는 요즘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한다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만날 소설책 읽고 웹툰이나 보고 있지 어학 책은 펴놓고 있는 꼴을 못 봤으니. 여하튼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아들이다. 마음이 즐거워 그런지 내가 설거지나 빨래, 청소를 시키면 열에 아홉은 흔쾌히 해준다. 물론 내 마음에 쏙 들게 하지는 못하고 꼭 뒷손이 가게끔 하지만….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책이 있던데, 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딱 그렇다.
공부 말고 다른 길이 왜 없으랴. 대학 졸업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안다. '좋은' 대학을 나온들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알면서도 그 길에 목을 매는 심리는 무엇일까.
11월인데, 춥고 스산하다. 한겨울보다 이맘때가 외려 더 추운 듯하다.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이리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1월을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부른다고 한다. 곱씹을수록 의미심장한 이름이다. 27일에 설령 최악의 성적을 받더라도 그것은 다만 숫자일 뿐,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청춘은 고스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박정애/강원대교수·스토리텔링학과 pja83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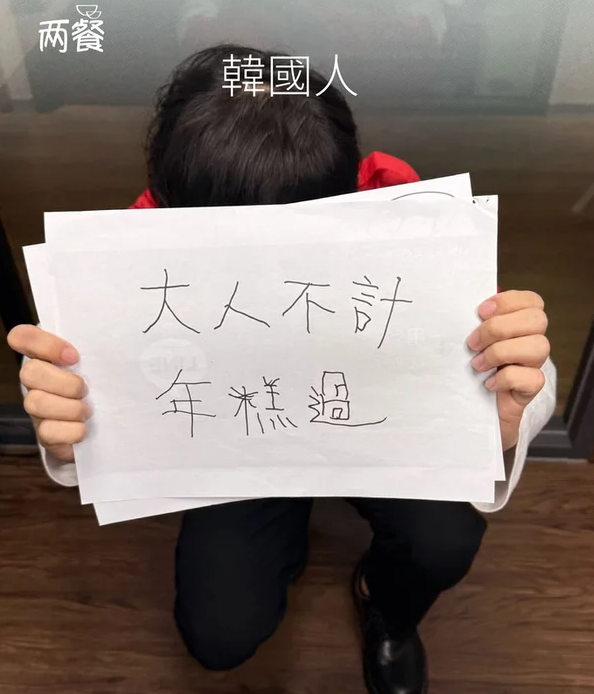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