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왕궁이 나사못 하나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기순 할머니를 두고 하는 것이다. 76세 기순 할머니는 맹장 암 말기이다. 없어도 되는 하찮은 맹장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다. 그 연세에 흔히 보이는 당뇨나 고혈압도 없고 치매는 더욱 깨끗했다.
젊어서 맹장 수술이라도 했다면 백수(白壽)를 누렸을 것이다. 기순 할머니의 남편도 "어이쿠, 나보다 8살이나 어린데 벌써 이런 병이 왔어"라고 할 정도로 맹장 암을 빼고는 건강한 노부부였다.
그렇지만 기순 할머니 내외는 25년 전 맏아들을 잃은 적이 있다. 시골 처가에 다녀와 쓰쓰가무시병에 걸린 것이 화근이었다. 혼자된 젊은 며느리는 아들 제사에 와서 손자만 놔두고 황망히 사라졌다.
경기도 포천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둘째 아들이 손자의 양육비를 댔다. 기순 할머니는 남편이 있는 대구와 아들이 있는 포천을 왔다갔다하며 살았다. 동물병원 일도 봐주고 손자도 키웠다.
포천 근처에서 맹장 암 수술을 세 번이나 하고서야 딸과 남편이 있는 대구로 내려왔다.
수의사인 둘째 아들은 "우리 어머니 아니셨으면 동물병원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라고 했다. 기순 할머니는 개의 제왕절개 수술 보조라든지 동물병원 전화받고 꾸려가는 일을 다 했단다.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 방 조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픽 웃음이 나왔다. "할머니, 진짜 동물병원 간호사였어요?"라고 물었다. 기순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그거만 했을까?"라고 했다.
심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마음은 병이 들기 마련이다. 그 뒤의 삶이 뒤틀려지거나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20년을 집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린 여인이 죽을병에 걸려서야 꿈에 그리던 두 아들을 만난 슬픈 사연도 있었다.
가족 전체가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의사 아들을 위암으로 먼저 보낸 아버지가 천주교와 등지고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봤다. 기순 할머니처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인생을 안절부절못하다가 방광암에 걸리자 짜증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301호 병실에서 "언모야, 언모야!"하며 목 내어 놓고 울던 88세 노모(老母)의 모습을 아침 회진시간에 봤다. 휠체어를 타고 요양 병원 환자복을 입고 호스피스병동에 병문안을 왔다. 혓바닥 암으로 말이 어둔한 65세 맏아들은 동그랗게 쌍꺼풀진 눈에 눈물만 글썽거렸다.
이제 우리는 오래 길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남겨진 삶이 비단 길인지 가시밭길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순 할머니처럼 그저 담담하게 살아낸다면 내 인생은 언제나 박수이다.
김여환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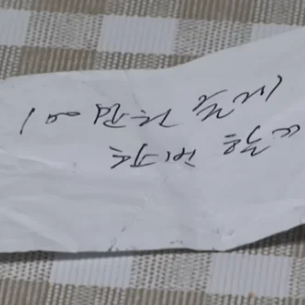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