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인 대(對)아세안 및 인도 관계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아세안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세계 경제와 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AEC(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AEC는 2015년 기준 명목 GDP 2조6천억달러,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한 경제권이 되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일 만큼 아세안은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를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교역은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2006년 618억달러에서 2017년 1천490억달러로 2.4배 증가해 연평균 6.9%에 이르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아세안은 2017년 각각 14.2%, 16.6%, 11.2%를 점해 2006년 5위 교역국에서 중국에 이어 2위 교역국으로 커졌다. 아세안 무역에서 얻는 흑자만 해도 2017년 414억달러로 전체 흑자의 43.5%를 차지한다.
AEC가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농촌지역은 1인당 소득이 3천달러 미만인 BOP(Bottom of Pyramid) 시장으로 회원국마다 종교와 관습이 다르고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아세안 지역이 하나의 개념으로 불리긴 하나 사실상 이질성이 큰 시장이다.
그동안 산업화 1차 도약 이후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성장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가 정체의 덫에 걸려 제2의 도약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서 포스트 차이나 대안이 절실하다. 아세안이 가지는 잠재 가치, 한국과 협력 가능성은 아세안과 한국 사이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을 상대하며 따라잡고 보자는 전략과 경험에서 벗어나 선도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세안 성장이 곧 한국 성장에 바람직하다는 의지의 표명을 전제로 한 한-AEC 간 상호번영과 선순환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동자원 개발과 경제 협력 등 다각적인 한-AEC 통상전략, AEC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수출전략 등 상호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큼직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 단계, 정치적 체제, 사회문화 특성에 기반한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아세안 또는 AEC 시장을 종교, 소득수준, 지역별로 세분화화여 프리미엄 시장(도심시장), 할랄 시장(이슬람권 국가), BOP 시장(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빈곤 해소가 주된 이슈가 되는 아세안 BOP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다. 이들 시장은 주로 농촌지역이라 이익 창출이 어렵고, 인프라 시설이 미흡하여 기업들이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안고 있는 빈곤 해소,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진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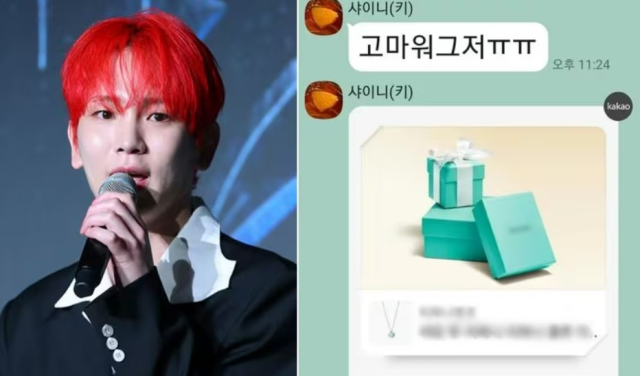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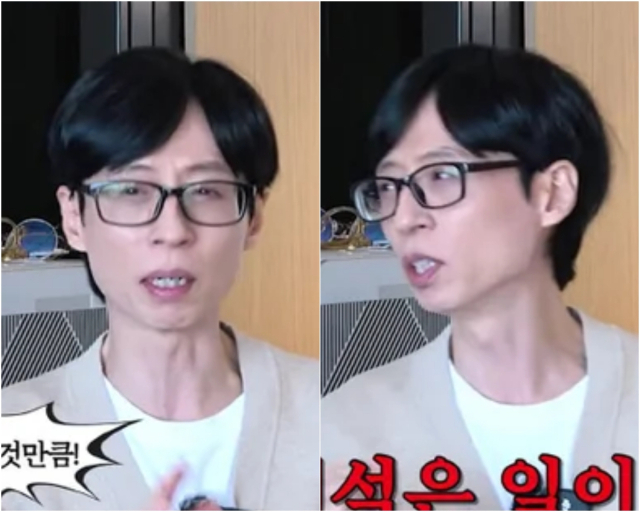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