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은 나가서 쇠도 보름은 집에서 쇠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지닌 의미는 객지에 나간 사람이 부득이한 일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기로, 보름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짓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보름까지는 집에 와서 생계이자 생존을 위한 농사짓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월에 드는 설과 대보름은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설날이 개인적 패쇄적 수직적인 피붙이들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대보름은 개방적 집단적 수평적인 마을 공동체의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두 관념이 서로 엇갈리며 달의 생성과 소멸 주기에 따라 긴장과 이완, 어둠과 밝음, 나에서 우리로 교체 또는 확장되는 일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둥근달을 통한 풍요 관념의 실행이라 하겠다.
대보름날에는 약밥 또는 오곡밥 먹기·묵은 나물 먹기·부럼 깨기·귀밝이술 등을 먹고 마신다. 풍년을 비는 기복행사로는 볏가릿대 세우기·복토(福土) 훔치기·다리 밟기·나무 시집보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달집태우기·달불이·집불이·소밥주기 등을 행한다. 그리고 제의와 놀이로는 지신밟기·별신굿·안택고사·용궁맞이·기세배(旗歲拜)·쥐불놀이·오광탈놀음 등이 있다. 이 같은 행사들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한 집단행사라 할 수 있다.
부럼 깨기는 오래 동안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온 우리네 민속이다. 기록에 따르면, '옛 풍속에 정월 대보름날 호두와 잣을 깨물어 부스럼이나 종기를 예방하였다. 궁중에서는 임금의 외척들에게 견과류를 나누어 주었고, 시정에서는 밤에 불을 켜놓고 그것들을 팔았는데, 집집마다 사 가느라 크게 유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부럼 깨기는 이를 튼튼하게 한다는 주술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날밤·호두·은행·땅콩 같이 딱딱한 것을 이용하는데, 때로는 그보다 부드러운 무를 대용하기도 한다. 대체로 여러 가지를 함께 골고루 마련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였다. 이 같은 견과류는 집집마다 보름 전날 미리 물에 씻어 준비해 두었다가 보름날 아침에 저마다 어금니로 힘주어 한 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또는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 안 나게 해 주소서" 한다. 이 같은 의례는 정초의 세시풍속인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이 더해져 우리네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귀밝이술은 대보름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이다. 남자 어른부터 남자아이, 여자 어른과 여자아이까지 모두 마신다. 그러나 아이들은 술을 입술에 묻혀만 주고 마신 것으로 하였다. 그때 "귀 밝아라, 눈 밝아라" 하며 덕담을 하였다. 평소 술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귀밝이술을 함께 마셨다. 그리고 술을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은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다.

김 종 욱 문화사랑방 허허재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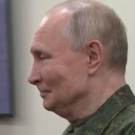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