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력 정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살통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3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던 우리나라가 2017년 잠시 1위 자리를 리투아니아에게 내어 주었다가, 2018년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다시 1위로 돌아왔다. 이는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연달아 비슷한 유형의 자살보도가 여과없이 인터넷과 방송, 신문지면을 채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유명배우의 자살 보도 후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에 이르는 모방자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배우의 경우 극중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배우의 극중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들의 죽음까지도 모방하는 행태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한다. 이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모방자살을 하였던 사례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유명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일반인의 80~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사람의 자살은 주변인 5~10명에게 자살충동을 심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언론이 유명인의 자살을 너무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우 자칫 자살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살보도의 분량이 증가할수록 모방자살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의 지나친 선정적인 보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파게노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극 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다. 이 때 세 명의 요정이 나타나 그를 말린다. 죽음의 유혹을 극복한 파파게노는 여인을 다시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즉, 언론이 요정의 역할을 하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해 주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한다. 언론은 '베르테르 효과' 보다는 '파파게노 효과'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란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체리향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자살을 도와줄 사람을 찾던 주인공 바디에게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들려준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결심했던 그는 나무에 목을 맬 찰나에 체리가 나무에서 떨어졌고, 죽기 전 체리를 맛보던 그는 지금까지 몰랐던 행복을 느꼈다. 이후 이른 아침 동이 트는 장엄한 광경을 보다가 죽기를 포기하고 체리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삶이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뒤틀린 욕망이 삶을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위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2%의 생존자들은 수면 위로 떨어지는 4초 동안 가장 많이 든 생각이 후회였다고 한다. 이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이 삶에 대한 의지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 중 95%는 비록 심각한 부상을 당한 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살 시도 없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체리'는 있다. 다만,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마음만 바꾸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지금이라도 자살 고위험군 선별, 항우울제 치료, 자살자 위기 개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장훈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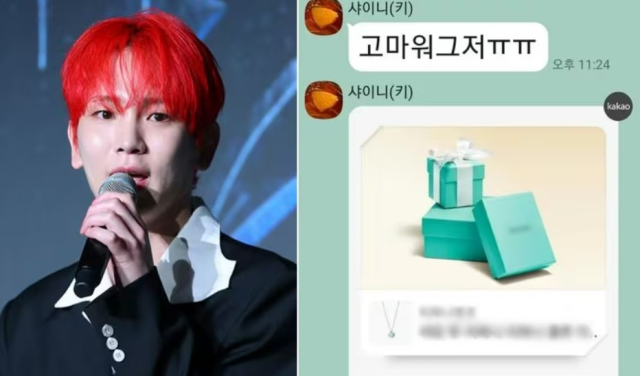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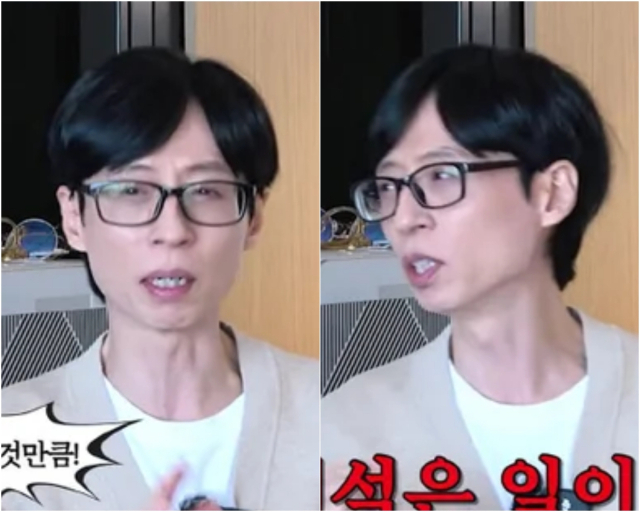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