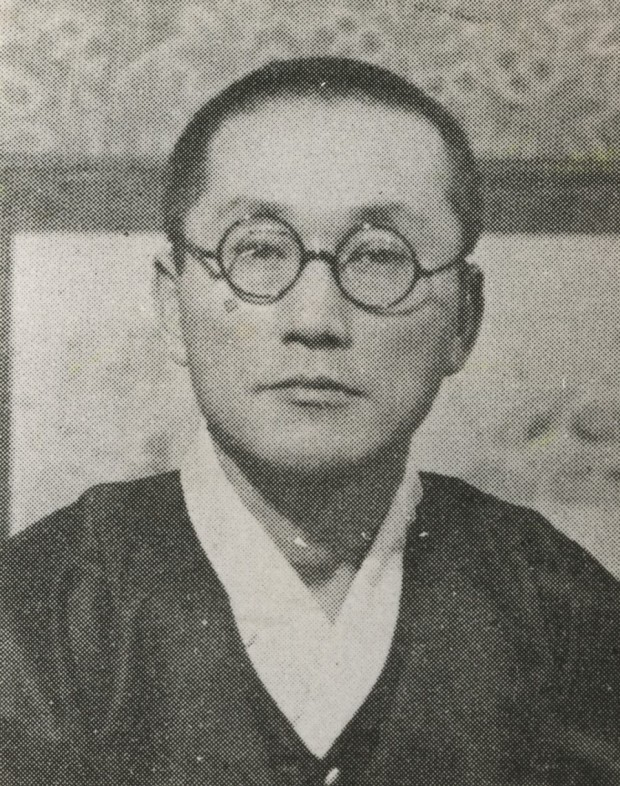

'무정'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오는 삼랑진 수해 현장이다. 서사를 끌고 오던 형식·영채·선형이라는 삼각관계의 긴장이 여기서 갑자기 해체된다. 복선도 없이 생뚱맞다는 비판이 나오는 장면이다. 사실 그 직전까지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도 영채에 대한 미련과 연민으로 번민한다. 병욱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는 영채도 형식에 대한 애증이 진행형이다. 이 둘의 관계를 눈치챈 선형도 질투의 격랑에 휩싸인다. 이렇듯 삼각형의 세 예각에서 발산되는 감정과 학문에 대한 포부가 기차 안의 여름 공기를 더욱 후덥지근하게 한다.
이렇게 부산으로 달리던 기차가 삼랑진역에서 멈춰 서면서 사태가 급변한다. 홍수로 선로가 끊겨 복구하는 데 한나절은 걸릴 판이다. 기차에서 나오니 가난하고 힘없는 수재민들이 속절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갑자기 깊은 연민에 빠진 네 명의 청년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재민을 돕기 시작한다. 그러나 책장이나 넘기던 도회지 젊은이들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문득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병욱이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한다. 음악회를 열어 성금을 모으자는 것이다.
논밭이 물에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 비탄에 잠긴 수재민을 눈앞에 두고 음악회를 연다니, 매치가 되는 아이디어인가. 다행히 음악을 들을 청중은 대부분 대합실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고 이들의 주머니는 비어있지 않다. 병욱의 바이올린 독주를 시작으로 영채의 독창과 세 여성의 합창이 이어진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슬픔에 가슴이 눌렸던 일동은 그만 울고 싶도록 되고 말았다. 병욱의 손이 바이올린의 활을 따라 혹은 자주, 혹은 더디게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일동의 숨소리도 그것을 맞추어서 끊었다 이었다 하는 듯하였다. [...] 애원한 가는 소리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듯이 길게 울더니 병욱은 바이올린을 안고 고개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한 박수성이 일어나고 한 곡조 더 하라는 소리가 일어난다.
대합실은 감동의 도가니로 변한다. 한 시간도 안 되는 음악회가 끝나자 즉석에서 팔십여 원이 모인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나 서장에게 넘겨 수재민을 돕도록 한다. 그사이 남녀상열지사의 혼란한 감정은 말끔히 씻겨나간다. 대신 청년들의 가슴은 조선의 계몽을 위해 한 몸 불태우겠다는 열망으로 부푼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뜬금없는 비약이라고 비판하는 논자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저 삼랑진 사건은 계산된 미학적 포석을 깔고 있다.
왜 삼랑진이겠는가? '삼랑(三浪)'은 밀양강과 낙동강이 만나 세 개의 물결을 이룬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기차가 멈춰 서면서 학문(진)과 윤리(선)와 예술(미)이 만나는 삼랑 현상이 일어난다. 청년들의 혼탁한 삼각 감정이 정화되고 진선미가 삼박자를 맞춘다. 이것을 촉매하는 것이 음악이다. 삼랑진을 떠나 일본과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네 청년의 전공을 보자. 한 사람은 생물학, 또 한 사람은 수학, 나머지 두 사람은 음악이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던 1910년대 일제 치하에 민족을 구제하겠다며 음악 유학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당한 것 같다. 오늘날 한국을 구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K-팝이다. 백 년 전의 이광수가 이걸 예감이야 했을까마는 민요에 대해 논문까지 쓴 사람으로서 음악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최소한 무정을 유정으로 변환하는 데 음악만 한 게 없다는 것은 삼랑진 음악회로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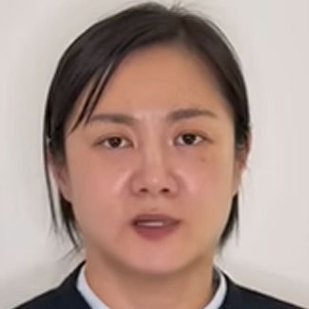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