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어(成語)로, 공자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스승의 자격을 불과 다섯 글자로 간단하게 제시한 말이지만, 지금도 이보다 나은 스승의 정의는 없다. 사람들은 복고(復古)를 유학(儒學)의 속성 중 하나로 여기므로 '지신(知新)'보다 '온고(溫故)'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자가 역사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공자에게 역사적 지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였다.
공자의 제자 자장(子張)이 "열 왕조(王朝)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평소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말을 배격한 공자이지만, 이 질문에는 "알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하였다. 다만 이전의 왕조가 건국하였던 역사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각지(各地)의 수재(秀才)들이 공자를 찾아와 제자가 된 목적은 역사를 배우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미래였다. 그래서 공자도 스승은 미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미래학(未來學)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인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되지 않으리라.
혹자는 미래학을 점술(占術)과 혼동하기도 한다. 양자는 모두 '미래를 예측(豫測)하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학이 과학적·사회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라면, 점술은 초자연적 수단이나 상징 체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영적(靈的) 행위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방법을 묻자, 공자는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샤머니즘 차원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섬겼으며, 죽음에 대한 관심도 컸다. 이러한 시대에 공자가 "인간도 잘 섬기지 못하는 형편에 귀신 섬기기를 말하며, 삶도 모르면서 죽음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였으니,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지닌 공자는 무당과 차원이 다른 미래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고대 중국의 상(商) 왕조 말기에 거북의 배딱지나 짐승의 어깨뼈에 문자를 새기고 불을 가해 생긴 균열을 해석하여 신의 뜻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갑골점(甲骨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을 해석하는 사람이 무당이었다. 원래는 갑골에 미리 점치는 내용을 쓴 뒤 불을 가해 터지는 금의 모양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지만, 갑골에 균열(龜裂)을 만든 뒤에 자의적으로 내용을 써 넣어 결과를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였으니, 정치가 점술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정치인의 무속 물의(物議)가 끊이지 않는데, 가십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한나라 이후로 무당에게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술(巫術)에서 의술(醫術)이 분리되었다. 옛사람도 '巫(무: 무당)'는 '誣(무고)'라고 철저히 배격하였다. 운명이 걸린 일의 결행을 앞두고 찾아갈 대상은 무당이 아니라 스승이다. 다만 스승은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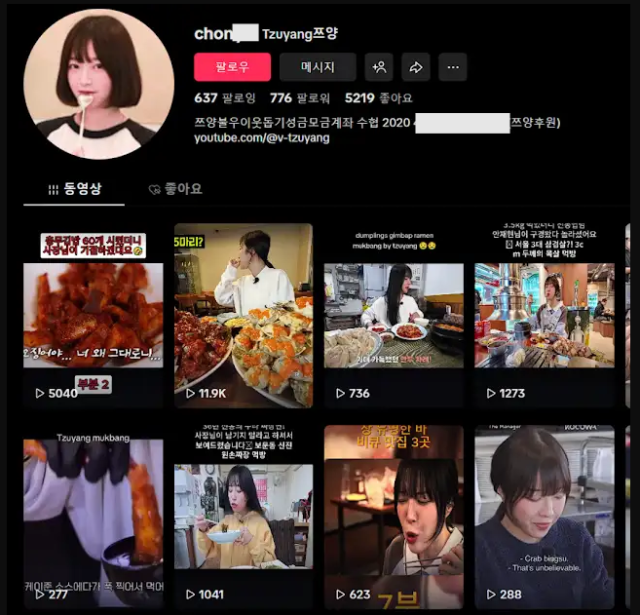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