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은 '한글창제'에만 있지 않았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왜구(倭寇)의 지속적인 해적행위로 인한 경상 및 전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았다. 이종무장군을 '삼군도제찰사'로 삼아 227척의 함선, 17,000여명의 군사를 출병시켜 대마도를 정벌하는 데 성공했다. '기해동정'(己亥東征 대마도정벌 1419)이었다.
왜구의 근거지를 장악한 조선은 이후 대마도를 조선에 복속시키지는 않았지만 조선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산포 등 3개 항구를 지정, 대마도가 조선과 무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실록>은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요, 다만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도적질하고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바다에 외롭게 떨어진 섬일 뿐이다."( 對馬爲島, 本是我國之地, 但以阻僻隘陋, 聽爲倭奴所據。 乃懷狗盜鼠竊之計, 歲自庚寅, 始肆跳梁於邊徼, 虔劉軍民, 俘虜父兄, 火其室屋, 孤兒寡婦, 哭望海島, 無歲無之...)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6월9일)라 기록했다. 대마도가 세종의 정벌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인식이 확인된 기록문서다.
조선에 귀속된 대마도주는 조선에 일본 '막부'와의 외교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무로마치(室町)막부의 쇼군 아시카와 요시모치(足利義持)의 사망 및 새로운 쇼균 즉위를 전하면서 조선조정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조선통신사 박서생
"일본통신사(通信使) 대사성 박서생, 부사(副使) 대호군 이예, 서장관(書狀官) 전 부교리(副校理) 김극유가 길을 떠나는데, 신주(新主)의 사위(嗣位)를 하례하고 전주(前主)에게 치제(致祭)하기 위함이었다."
역시 세종실록 기록이다. 조선은 1428년 대사성 박서생을 첫 통신사로 파견했다. 조선의 통신사 파견은 일본을 왜구들의 소굴로 정벌의 대상으로 대하다가 이웃나라로 인정하고 교류·협력하기 시작한, 외교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일대사건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임진·정유재란 등 두 차례 전쟁에도 불구하고 1811년까지 총 12차례나 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교류를 이어갔다.
조선통신사 박서생의 흔적을 의성에서 찾은 것은 뜻밖이었다. 의성을 가로질러 흐르던 위천이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곳이 '낙단보'와 낙단대교가 있는 의성군 단밀면이다. 강을 건너면 상주시 낙동면이다. 그곳에 박서생이 일본에 갈 때 탄 통신사선을 축소 재현한 '율정호'가 운항하고 있었다.
나루터가 있는 단밀면 낙정리 주변은 수차를 돌리는 농부 조형물을 세워 이곳이 '청년통신사공원'을 조성했다. 박서생은 일본을 다녀온 후 일본이 활용하고 있던 수차도입을 세종에게 건의, 우리나라 농사기술의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1986년 '낙단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강을 건너려면 나루터를 오가는 배를 타야했다. 낙정나루는 의성과 상주, 선산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룻배를 이용한 교통요지였다. 일제시대에는 낙동강 하구에서 소금배가 올라오기도 해 나루터 인근에는 소금과 양곡창고도 여럿 있었을 정도로 번창했다. 강변 양쪽에 자리 잡은 매운탕집과 한우식당이 늘어선 '먹거리촌'은 나룻터의 영화(榮華)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낙단보 건설과정에서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된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낙단보와 낙단보문화관 사이에 위치한 마애보살좌상은 2010년 낙단보 조성과정에서 발견돼 문화재청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한 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온화한 미소를 띤 마애보살좌상은 고려초기의 양식으로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안(江岸) 화강암 바위에 조각됐다는 점에서 고려 때부터 강을 건너는 나룻배와 사공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운'(水運)신앙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불상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청년통신사공원은 의성에서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낙동강 3대 누각의 하나로 꼽히는 '관수루'(觀水樓)에 오르면 의성과 상주·선산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수루는 고려시대 세워져 1734년 중건되는 등 여러차례 보수와 중수를 거듭하다가 1874년 유실됐다가 1990년 복원됐다. 관수루 바로 옆에 '구산 박서생유허비'가 세워져있다.

◆박서생의 본관 비안
박서생의 본관은 비안(比安)이다. 병산 박씨라고도 불리는 비안 박씨의 입향조다. 비안면 동부리(동부안길76)에 가면 거대한 '조선초대통신사율정박선생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수풀 우거진 한적한 야산에서 만난 박선생기념비는 그의 초대조선통신사 행적이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도 28호를 따라 안계에서 봉양방면으로 가다가 비안면 동부리 방향의 도로로 들어서자마자 '병산정 800m' 팻말을 따라 1km 남짓 구불구불 마을 안길과 산길을 따르다보면 정자가 보이고 그 길 뒤편에 자리한 병산정 등 율정의 유적을 만나게 된다.
수풀사이로 솟아오른 화강암이 보인다. 4~5미터에 이르는 웅장한 비석이다. 기념비 좌우로도 2개의 비석이 기둥처럼 세워져있고 그 위에 거대한 돌판을 고인돌양식처럼 얹은 구조다.
박서생의 행적을 되짚어가다 보면 식민지배시대를 거치면서 뒤틀린 한일관계의 변곡점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대마도정벌과 조선통신사 파견은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음을 증명한다.
고려의 충신으로 조선개국에 참여하지 않은 야은 길재는 초야에 묻혀 후학양성에 매진했고 조선 사대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박서생 역시 야은의 제자였다. 박서생의 호는 율정. 그는 스승으로부터 충효를 배웠고 학문이 뛰어났다.
약관에 진사가 되고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중시에 발탁돼 정언 지제교가 된 그는 1411년 태종때는 친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어 사헌부 집의, 대사성, 대사헌, 집현전 부제학, 공조참의(정3품), 안동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글을 쓰는 선비로서가 아니라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실용에 힘을 썼다.
그가 조선통신사로 발탁된 것은 '대사성'일 때였다. 대사성은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총장'격으로 세종으로서는 최초의 조선통신사로 대사성으로 하여금 임금의 친서를 전하고 조선의 문물을 전하는 최고의 예(禮)를 표한 셈이다.
당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고생스러웠을 것이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도성 한양을 떠나 부산을 거쳐 뱃길로 시모노세키에 도착, 6개월 만에 막부가 있는 교토에 도착했다. 조선통신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6개월여의 귀로를 거쳐 다시 세종에게 통신사 사행록을 전했다.
세종실록에는 박서생의 통신사 사행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정세와 동정, 즉 왜구의 동향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했고 막부의 요청사항도 적시했다. 또한 일본에서 본 '수차'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세종이 즉시 이를 받아들여 농사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기념비 옆으로 율정의 시비가 5개 조성돼 있었고 기념비 바로 뒤에는 자그마한 한옥이 한 채 있었다. '병산정(秉山亭)'이다. 박서생의 후손들이 일제 강점기에 지은 정자로 담벽 일부가 허물어져있고 문도 뜯어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했다.
一飯聊申一祝辭
君恩片重遠遊時
盤飱日日多兼味
尊酒時時滿大巵
異卉幽花隨處好
回山曲水到頭奇
不因奉使來東域
天下奇觀總不志
끼니마다 축사를 받으니
멀리 와서야 임금의 은혜를 알게되고
날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때마다 좋은 술이 큰 잔에 가득하네
기이한 화초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산 고비 도는 물길도 신기하네
일본에 사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천하의 기이한 경관을 몰랐으리라
율정이 남긴 칠언율시 <奉使日本有感>이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지극한 환대와 그에 대한 감회를 잘 드러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didero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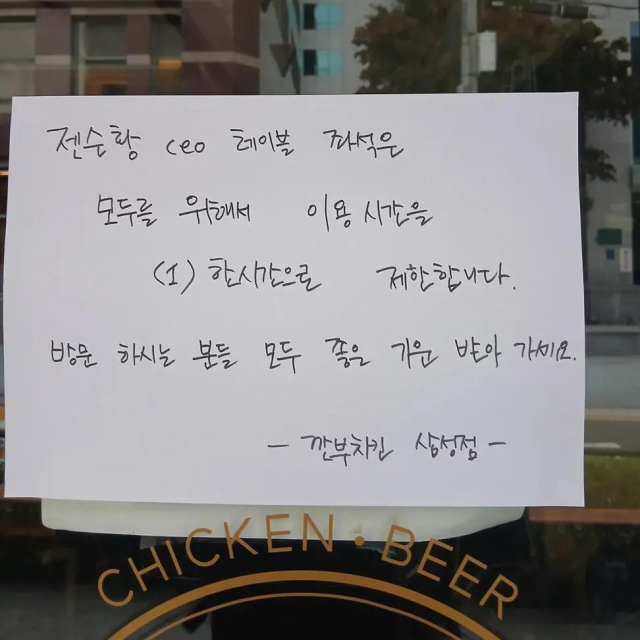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