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성천과 하나 되는 순간
열기를 품은 강바람이 모래톱을 스친다. 눈부시게 하얀 모래 위로 한여름의 햇살이 뜨겁게 쏟아지지만, 신기하게도 눈은 시원하다. 유유히 흐르는 내성천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나그네를 맞아주기 때문이다.
저만치 외나무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조심스레 발을 딛고 싶은 충동이 인다. 좁고 긴 다리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면서도, 걷고 싶은 설렘을 일으킨다. 내성천의 물결과 고운 모래톱, 그리고 외나무다리가 어우러져 빚어낸 무섬의 풍경은 한층 더 유려하고 깊다.
내성천 수면 위를 왜가리 한 마리가 기품 있게 거닌다. 천변을 따라 늘어선 짙푸른 신록은 꿈결처럼 평화롭다. 물결이 일으킨 바람이 천변의 숲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신록은 싱그럽게 몸을 흔들며 화답한다. 이 황홀한 자연 속에서 나그네는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고 온전한 쉼을 누린다.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폭이 좁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뎌야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길을 건너야 비로소 무섬에 닿을 수 있다. 이 다리는 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경계의 문턱이자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건너야 하는 인생의 징검다리다.
마을과 바깥을 잇는 더 큰 다리, 수도교가 있다. 그 다리를 통해 차와 관광객이 드나든다. 그러나 무섬의 진짜 다리는 따로 있다. 바로 외나무다리다.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인생의 길처럼, 이 다리는 진리를 일깨우는 상징이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길이다.
외나무다리에 발을 딛는 순간, 뜻밖의 두려움이 몰려왔다. 생각보다 다리의 폭은 좁다. 발끝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곧장 내성천으로 빠질 것만 같다. 그렇다고 발길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다리 위에서 나는 오롯이 홀로 서 있다.
천천히 한 발씩 내딛자 두려움은 서서히 가라앉고 이내 마음속에 평온이 번져온다. 발아래 흐르는 내성천의 물결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강 위로 펼쳐진 하늘은 눈부시게 쾌청하다. 물결은 마치 즐겁게 어깨동무한 듯 다리 아래로 흘러내린다.
내가 다리를 걷는 것인지, 바람이 나를 이끌어 걷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외나무다리 위에서 비로소 나그네는 내성천과 하나가 된다.

◆서로 기대어 완성된 마을
무섬은 여느 육지 마을과는 사뭇 다르다. 본래 이름은 '물섬마을', 곧 물 위의 섬이라 불린 전형적인 물도리 마을이다. 태백산과 소백산 줄기 사이에 앉은 이 마을을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수백 년 동안 감싸 돌며 키웠다. 내성천은 마을을 일으킨 물길이자 사람들을 먹여 살린 젖줄이다. 그래서 무섬 사람들에게 내성천은 단순한 강줄기가 아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고, 가치이며, 문화이고,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보는 맑은 거울이다.
무섬의 역사는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오른다. 1666년, 반남 박씨(潘南 朴氏) 문중의 박수(朴檖. 1641~1729)가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다. 세상은 병자호란의 혼란으로 어지러웠고 많은 이들이 난리를 피해 산천으로 숨었다. 무섬으로의 입향 또한 그러한 은둔의 뜻을 품고 있다. 목숨을 잇고 집안을 살려야 했다.
뒤이어 사위로 선성 김씨(宣城 金氏) 김대(金臺, 1732~1809)가 들어오면서 마을은 두 문중이 함께 집성촌의 역사를 일군다.

반남 박씨 입향조가 지은 고택은 만죽재(晩竹齋)라 불리고 선성 김씨 후손이 지은 집은 해우당(海愚堂)이라 전해진다. 마을에 남은 40여 채 고택 가운데 30여 채가 사대부 가옥일 만큼, 무섬은 지금도 양반 마을의 품위를 간직하고 있다.
후손들은 격식에 매이지 않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무섬의 시간을 살아낸다. 통혼으로 귀한 인연을 이어간 집도 있다. 외지인들의 출입이 많아지며 어떤 집은 한옥 민박, 식당, 카페로 단장하여 일상을 가꿔간다. 오늘날 무섬은 격식만을 고집하는 양반 마을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돋보이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마을 들머리에 해우당 고택이 있다. 선성 김씨 입향조 김대의 손자인 김영각(金永珏, 1809~1876)이 1800년대 초반에 지은 집으로, 그의 아들 해우당 김낙풍 (金樂灃, 1825~1900)이 중수한 고택이다. 2024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고택과 유물 일괄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해우당 고택도 그렇지만 무섬의 고택들은 대부분 'ㅁ'자형 뜰집 구조로 지어졌다. 바깥의 찬바람은 막고, 안마당으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 지혜로운 집이다. 사방이 안마당을 향해 열려 있어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 서로를 마주 보며 살아간다.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쉼터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삶은 그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쌓였다.
무섬에는 사대부 가옥만 있지 않다. 정겹기 그지없는 소박한 초가들이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낮은 돌담과 마당에 피어난 꽃들은 무섬이 마치 꽃동네가 아닌가 싶게 만든다. 서민들의 삶터였던 까치구멍집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것이 사대부 가옥이든 초가든 굳이 선을 그을 이유는 없다. 마을의 집들은 서로 기대며 무섬이라는 마을을 완성하고 있다.
무섬자료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얼마되지 않아 이 마을의 뿌리라 할 만죽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무섬에서 가장 오래된 집, 300년을 훌쩍 넘긴 입향 시조의 고택이다. 19세기 후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의 정성과 애정이 깃들지 않았다면 이미 허물어졌을 터다. 흙으로 지은 한옥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일까, 눈앞의 만죽재가 세월의 풍파에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더욱 귀하다.
마을 곳곳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오랜 세월을 버틴 마을에 어찌 흠이 없으랴. 마을을 지켜내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도시의 집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무섬은 이렇게 제 모습을 지키고 있다, 무섬이 오래도록 보존되는 이유가 이렇게나 뜻깊다.

◆한국인 본래의 마을, 무섬
해우당 고택 가까이, 무섬의 정신을 대변하는 집이 하나 있다. 바로 아도서숙(亞島書塾)이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니 작은 마당이 나타나고, 가장 먼저 태극기가 눈에 들어온다. 문지방에 걸린 태극기는 이곳이 단순한 서당이 아니라 청년 지사의 뜻을 품은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적막하나 한때는 마을 청년들의 발길과 목소리가 서숙 안팎을 가득 메웠을 것이다.
무섬에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은 인물만도 다섯이나 된다. 특히 선성 김씨 문중 후손들이 이끌었던 민족운동은 무섬만의 자랑이 아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무섬의 후손들은 은둔만 한 것이 아니다. 대의를 좇아 마을 밖으로 나가 독립을 외친 이들이 적지 않다. 마을과 나라를 지킨 정신이 지금도 아도서숙에 고요히 배어 있다.

무섬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다. 더 깊이 존중받아야 할 한국인의 터전이자 보기 드문 마을 공동체다. 집 하나하나가 마을의 역사가 되었고, 그 안에 배어 있는 기억은 마을의 문화가 되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듯 겸손히 발을 들여야만 무섬은 비로소 그 진짜 얼굴을 내어준다. 그래서 무섬을 찾는 길은 구경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잃은 본래의 마을을 찾는 길이라 해야 한다.
더는 외나무다리로 꽃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새색시가 없다. 차들은 수도교를 건너 마을로 들어온다. 그러나 외나무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겸손히 걸어야만 비로소 무섬에 닿을 수 있다고 다리는 묵묵히 일러준다.
외나무다리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우리는 끝내 저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레 내디뎌야 한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무섬은 객지를 돌다 고향을 찾은 우리 모두를 반기는 마을로 다가온다.

양진오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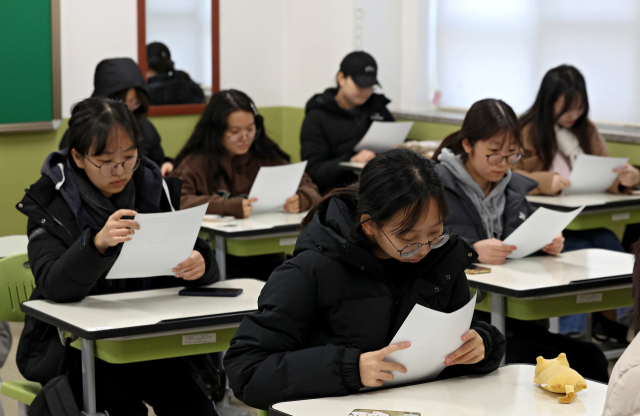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윤재옥 "TK 통합은 생존의 문제…정치적 계산 버리고 결단해야"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