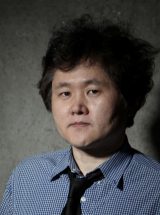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대구 북성로 인근. 이곳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은 오늘도 음악을 만든다. 그러나 이들에게 음악은 예술이기 이전에 '생활'이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이 되면 연습실로 향한다. 그들의 음악에는 분명 열정과 집념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서울, 특히 홍대를 중심으로 한 인디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클럽과 레이블, 제작·유통 네트워크, 미디어 노출 기회 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뮤지션은 대중문화 영역으로 진입하며 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물론 서울도 녹록지 않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있다.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인프라는 부족하고, 공연 기회는 드물며, 관객 수도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음원 수익은 거의 없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뮤지션들은 직접 곡을 쓰고 연주하며, 앨범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까지 스스로 감당한다. 지역 문화 기금에 수차례 지원서를 내지만, 수혜자는 적고 결과는 늘 불확실하다.
그나마 대구음악창작소를 비롯한 몇몇 소규모 기획 단체들이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최근 열린 '2025 D-사운드페스타'나 대구 MBC에서 편성 중인 인디 뮤지션 소개 코너 등은 고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씬을 실질적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는 연결망은 느슨하다.
여기에는 창작자들 자신의 변화도 필요하다. 체계적인 자기 브랜딩, 관객을 고려한 공연 구성, 타 장르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지 좋은 곡을 만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
사실 서울과 대구의 차이는 규모나 인지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언젠가는 뜨겠지"라는 희망보다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더 큰 현실이다.
냉정히 말해, 이는 개인의 열정 부족이나 실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본질적인 원인이다. 지역 인디 씬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연장, 기획사, 유통 채널,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뮤지션 개인의 '희생'과 '열정'에만 기대는 구조로는 확장도, 지속도 어렵다.
음악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가 20~30세대의 문화를 품고자 한다면, 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이들의 삶부터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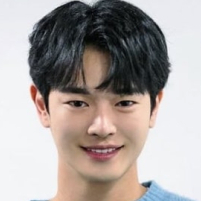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