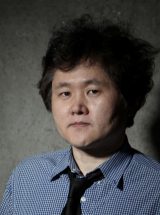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사진을 찍지 않는 날이 있을까? 우리는 매일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다시 지운다. 스쳐 지나간 풍경도, 마음이 머문 순간도 우리는 자연스레 카메라에 담는다. 그렇게 사진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하고, 기억보다 선명하게 순간을 담아낸다. 그래서일까. 문득 어떤 장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사진같다."
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빗방울이 맺힌 나뭇잎, 거리의 사람들 위로 내려앉는 노을과 그림자, 그림 같은 장면이 너무 또렷하고 선명할 때 우리는 무심코 그런 말을 꺼낸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순간을 '사진'에 빗댈까?
'사진같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실이 정지된 이미지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치 필름 속에 이미 찍혀 있었던 것 같은 장면 앞에서 나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그 순간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이미지로 인식되는, 경계의 시간이다.
우리가 사진을 '기억의 대체제'처럼 여기는 데에는 근대 이후 시각문화의 흐름이 있다. 19세기, 니엡스와 다게르가 처음 이미지를 고정했을 때부터, 사진은 현실을 포착하고 재현하는 기술이자 동시에 해석의 수단이었다. 세상을 빛과 구도로 정지시키고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힘. 그런 맥락에서 '사진 같다'는 말에는 시각적 유사성뿐 아니라 정서적 응시가 깃들어 있다.
회화가 오랜 시간 '그림같은' 이상을 추구해 왔다면, 사진은 현실의 결을 포착하는 데서 감동을 만들어냈다. '사진같다'는 말은 그 두 층위가 겹치는 지점에서 나온다. 어떤 장면이 너무 완벽하게 짜인 구도로 보일 때, 감정이 정지된 화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말로라도 붙잡고자 한다.
또한 '사진같다'는 말에는 감정의 거리도 포함돼 있다. 그 장면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다. 감정은 남아 있지만,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음미하는 감각.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상의 편린 속에서도 '사진같은' 순간을 찾고 기록한다. 음식 위에 떨어진 빛, 골목의 풍경, 아이의 표정-모두, 감탄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록의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술을 넘어, 감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태도가 됐다.
결국 '사진같다'는 말은, 사라지는 것을 멈추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낸다. 흐르고 흩어지는 삶 속에서, 어떤 한 장면만큼은 선명히 남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셔터를 누르고, 말을 꺼내고, "사진같다"고 되뇌는 이유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조용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



































댓글 많은 뉴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한동훈 "윤석열 노선 끊어내야"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설 자리 없어…'朴·尹·대한민국 잡아먹었다'더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