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의 가마꾼이 멘 뚜껑이 없는 가마에 긴 담뱃대를 든 여성이 느긋하게 앉아 있다. 물빛 쓰개치마 아래로 풍성한 가채가 살짝 드러났고, 자줏빛 회장을 댄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었다. 여성은 가마를 탔고 남성은 걸어간다.
고갯마루를 막 넘어서는데 바람이 분다. 남성은 흔들리는 갓을 한 손으로 잡으며 가마 위의 여성과 눈을 맞춘다. 긴 갓끈이 휘날리고 도포 고름, 풍성한 도포 자락도 바람에 나부낀다. 겉옷이 펄럭이니 그 안에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옥색 누비조끼를 입은 것, 산뜻한 남색 각주머니를 찬 것, 연한 자주색과 겨자색 허리끈을 길게 드리운 것 등이 드러났다.
한복은 원래 몸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는 평면 재단이라 옷태를 내는 것은 끈 치레라고 했다. 갓끈, 옷고름, 허리끈 등의 길이와 폭, 색깔이 화음을 이루며 어우러지고, 도포 고름과 대칭되게 반대쪽으로 외지게 묶은 도포 끈도 한몫을 한다. 신윤복이 그림 속으로 바람을 불어오게 한 것은 풍성한 옷자락과 어울린 끈 치레로 이 남성의 맵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차분하고 멋스러운 차림새의 두 남녀가 이렇게 오붓하게 도시를 벗어나 나들이에 나섰다면 한량과 기녀인 이 둘을 연인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왜냐하면 이 작품이 들어있는 '혜원전신첩' 30점을 보면 기녀와 한량이 야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어울려 놀 때 두 쌍이나, 세 쌍이 함께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이다.
제화도 이 남녀에 어울린다. '낙양재자지다소(洛陽才子知多少)', 즉 '낙양의 풍류객이 얼마나 되리오?'라고 호기롭게 묻는 것은 서울에 멋쟁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만하기는 흔치 않으리라는 자부의 뜻이고, 신윤복이 이들의 풍류를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이 나들이가 색색으로 곱게 물든 단풍 구경을 위한 가을 소풍임을 알려주는 것은 가마꾼이 머리에 꽂고 있는 단풍잎뿐이다. 이 단풍잎이 이 그림을 다 말해준다.
19세기 조선의 리얼함이면서도 격조가 있는 것은 신윤복의 그림 실력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이 나들이의 주제인 단풍놀이를 가마꾼 총각의 댕기머리에 꽂은 붉게 낙엽 진 나뭇잎으로 슬쩍 암시한 디테일이 있어서다.
일엽지추(一葉知秋)라고 했다. 나뭇잎 한 잎으로 가을을 안다는 말이다. 조선 후기 문인 심암(心庵) 조두순은 '일엽오비천하추(一葉梧飛天下秋)', 오동잎 한 잎 날리자 천하가 가을이라고 했고, 어느 당나라 시인은 '산승불해수갑자(山僧不解數甲子) 일엽락지천하추(一葉落知天下秋)', 산승이 날짜는 몰라도 잎 하나 떨어지면 천하가 가을임을 안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라는 노래 가사 또한 절창이다. 올해 대구 팔공산 단풍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와 11월 3일이 절정이라고 한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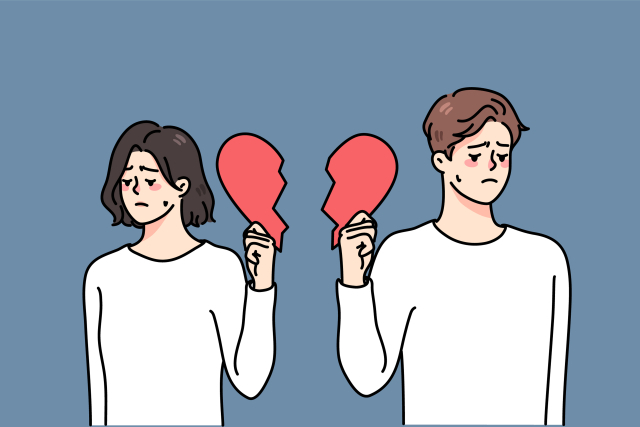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대구시장 선거 출마 "대구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주호영 등판' 달아오른 대구시장 선거판…현역 잇단 출사표 경쟁 치열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홍준표, 김종혁 징계에 "용병세력 일당 절연 못하면 당 내분 끝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