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이 뜨겁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새벽배송은 노동착취의 상징이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 안팎에서도 이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과 건강권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문제는 그 논리가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다. 노동권 보호라는 말은 언제나 옳아 보인다. 그러나 그 보호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고, 다른 집단과 시장 전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순간 평등은 이미 아니게 된다.
새벽 배송은 시장이 만들어낸 서비스다. 소비자는 편의성을 얻고, 기업은 경쟁력의 무기로 삼는다. 밤새 움직이는 물류망은 '배송 전쟁'을 치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들도 그 속도에 맞춰 뛰어왔고, 그 과정에서 물류 일자리는 늘었고, 서비스 품질도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새벽 배송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이 시장의 판 전체를 흔든다. 규제는 결국 선택권을 줄이고 비용을 올린다. 소비자는 늦어진 배송 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것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평등'인가.
민노총은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물론 맞는 말이다. 노동 강도가 과도하다면 개선하면 된다. 안전장치, 휴식 시간, 교대 근무, 인력 확충 등 방법은 많다. 하지만 '서비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접근은 다르다. 이는 시장의 구조를 통째로 재단하는 방식이다. 규제 하나로 특정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면,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산업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밤샘 근무가 일상인 의료·방송·제조·운송 직군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을 나눌 것인가. 새벽 노동을 아예 없애자고 하면, 야간 산업 대부분을 멈춰 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시장 전체와 사회 전체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분적 정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물류 산업이 이미 글로벌 경쟁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24시간 풀필먼트'를 더 확장하며 속도를 무기로 전장(戰場)을 넓히는 중이다. 여기서 한국만 "우리 사회는 새벽 배송 금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고 치자. 산업 경쟁력에 무엇이 남을까. 규제가 기술과 혁신을 이길 수 있을까. 문제는 단순한 배송이 아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류 속도는 제조업·유통·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와 직결되는 시스템이다. 하나가 느려지면 전체가 느려진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평등'과 동일시되는 순간 논쟁은 왜곡된다. 새벽 배송 금지 요구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등'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의 편익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평등일까?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이 사라지는 비용은 누구 몫일까?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민노총이 말하는 평등은 정말 모두의 평등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형평성만을 위한 평등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려 하는가. 서비스를 줄이는 사회인가, 품질을 높이는 사회인가. 경쟁을 피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될 것인가.
새벽 배송 논란은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평등'을 선택할지 묻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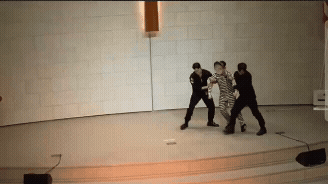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르포] 구미 '기획 부도' 의혹 A사 회생?…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韓 소명 부족했고, 사과하면 끝날 일"…국힘 의총서 "당사자 결자해지"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장동혁, 한동훈 제명 보류…韓, 공개사과 가능성 낮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