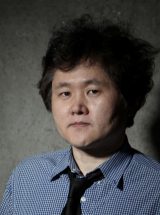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우리는 오랫동안 속도와 새로움에 매혹돼왔다. 무엇이 더 빠른가, 무엇이 더 혁신적인가를 묻는 말은 늘 시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변화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방식에 놓인다. 인간은 빠르게 계산하는 존재라기보다, 축적된 기록 위에서 판단하고 의미를 구성해 온 존재다.
기억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다시 불러오며, 무엇을 끝내 잊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기억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기억의 감각은 한국의 전통 미학에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 우리는 흔히 '백의민족'이라는 말을 관습처럼 사용하지만,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소박함이나 결핍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장식을 최소화한 한복의 흰 바탕은 비어 있는 상태라기보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여백이다. 시간이 흐르며 스며드는 생활의 흔적과 노동의 자국, 삶의 온기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흰옷은 완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기록을 전제로 천천히 형성되어 온 서사의 시간이다.
그 흐름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쌓이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표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감내해 왔는가 하는 문제다. 백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반복과 기록, 보존에 익숙해 온 문화적 배경 역시 이와 깊이 맞닿아 있다.
한국 현대미술 또한 이러한 기억의 미학 위에서 전개됐다. 단절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개인과 집단의 기억, 역사적 시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응시를 지속해 왔다. 그것은 새로움을 과시하기보다는, 무엇이 잊히고 있는지를 묻는 태도에 더 가까웠다.
오늘날 예술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분명해졌다. 모든 것이 저장될 수 있는 시대일수록, 예술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기억의 양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를 가늠하고, 효율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다. 무엇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끝내 지우지 않겠는가를 선택하는 태도. 연산의 시대를 지나 우리가 마주한 것은 기억의 시대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뤄온 방식 속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의 미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과 함께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李 "부자 탈한국은 가짜뉴스, 이런짓 벌이다니"…대한상의 '후다닥' 사과
광주 찾은 이진숙에…시민단체 "내란세력 광주 떠나라"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유영하 "삼성의 고향 대구에 반도체 공장·서울병원 유치… 대구 운명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