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터들이 대박을 터뜨릴 확률은?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 보다는 쉽겠지만, 어려운 것은 둘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웬만큼 안목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고, 부지런히 쫓아다녀도 평생 한두번쯤 행운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 그것도 요즘처럼 밝은 세상에서는 더욱 어려운 법이다.
며칠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화랑대표. 그는 "행운은 하늘이 내려주는 법"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대박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들려줬다. 운좋게 '국보급' 그림을 구했다가 거짓말처럼 하룻밤 만에 도둑맞은 얘기였다.
그는 80년대 중반 경북지역 한 고가에서 나온 그림 한점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샀다. 겉보기에 낡고 빛바랜 캔버스와 부서진 액자 등을 볼때 일제시대에 제작된 작품임에 분명했다. 캔버스 중간에 암자가 그려져 있고 그 뒤로 숲, 전면에는 계곡의 풍광이 있는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가 액자를 뜯어내고 캔버스 뒤쪽을 살펴보다 'RH'라는 영문 이니셜을 발견한 순간, 숨이 꽉 막혔다고 한다. 일제시대의 여류 화가이자 문필가 나혜석(1896~1948)이 말년 수덕사에 머물다 그린 작품이었다.크기가 무려 30호. 그녀의 그림은 작품수가 아주 적은데다 그나마 4,6호의 소품이 대부분인 만큼 거의 '국보급 작품'이었다.그 당시 가격으로도 3억원을 호가했다. '억대부자'라고 불렸던 시절인 만큼 작은 빌딩 몇채를 사고도 남을 액수였다.
그림을 함께 구한 화랑직원 등과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그 작품을 화랑에 두고 귀가했다. 다음날 새벽 '그림을 도둑맞았다'는 직원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그 작품과 직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
그는 그후 몇달동안 모든 일을 전폐하고 미친듯 작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빌딩을 구입해 가구점을 운영 하는 그 직원을 찾아냈으나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 그래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작품을 찾다 최종 소유자가 살해되고 그림마저 어디론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림을 찾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만약 그 당시 대박을 터뜨렸으면 평생 허황된 꿈이나 쫓아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아찔합니다. 지금까지 화랑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행운이 저를 비껴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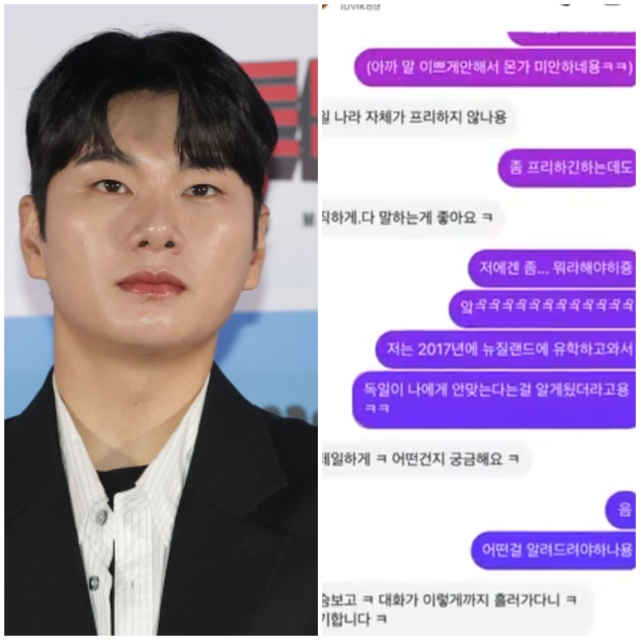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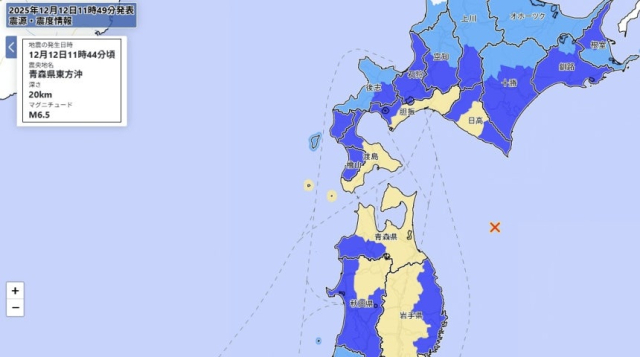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