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산성(管山城;충북 옥천)에 수천 명의 피를 쏟으면서 대가야의 태양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날랜 군사들은 사라졌고, 대궐 근위병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민심은 흉흉했다.
우륵(于勒)은 신라로 망명했고,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속세를 떠났다.
고을의 수령이 바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 빛을 바랬고, 먹구름은 비를 뿌렸다.
망국의 한과 서글픔이 담긴 비고, 눈물이었다.
넓은 제국을 휘두르던 대가야의 서슬 퍼런 칼날도 무디어져 갔다.
고을마다 병사들의 찢어진 갑옷 투구와 죽은 말들이 널브러졌다.
합천 야로의 철산지도 장인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철의 왕국' 대가야의 철은 그렇게 녹슬어갔다.
가야산(伽倻山)에서 흘러내린 가천(伽川)과 야천(倻川), 회천(會川)의 젖줄은 이제 비와 피로 서서히 물들었다.
500년대 초반, 신라는 낙동강 하구 대가야의 고을을 하나 둘 삼켰다.
고구려의 의존에서 완전 탈피, 제도를 정비하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힘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524년, 신라 법흥왕이 남쪽 국경으로 순행(巡幸)하며 땅을 넓혀가자, 가야국왕이 가서 만났다.
가야국왕은 대가야 또는 금관가야의 왕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땅은 넓어지고, 대가야의 땅은 날로 좁혀졌다.
기문(己汶;남원), 대사(帶沙;하동)와 함께 왜(倭)와의 교역 주도권까지 백제에 뺏긴 대가야는 생존을 위해 522년 신라 왕실과 정략결혼을 맺었다.
그러나 7년만에 신라는 대가야에 다시 침공, 도가 고파 포나마라 등 3개 성과 북쪽 경계지역 5개 성을 복속하면서 결혼동맹은 와해됐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532년 신라는 가야제국의 큰 세력, 금관국(김해)과 비화국(창녕)을 손아귀에 넣었다.
가야제국을 유린하면서 점차 백제 땅까지 넘보며 맹위를 떨쳤다.
금관국이 망한 뒤 북쪽 대가야와 남쪽 안라국(함안)을 중심으로 한 가야제국은 신라, 백제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의 외교노력을 기울였다.
백제 성왕은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긴 뒤 중흥을 꾀하던 중 자구책을 모색하던 가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이른바 '임나부흥회의'였다.
541년, 대가야를 주축으로 안라(安羅), 졸마(卒麻;함양), 산반해(散半奚;합천 초계), 다라(多羅;합천 쌍책), 사이기(斯二岐;의령), 자타(子他;진주) 등 가야 사신단과 왜(倭) 관리가 백제 사비에 모였다.
가야는 신라에 대응해 제국의 영토를 지키고, 백제는 신라에 맞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려는 속셈이 양쪽에 깔려 있었다.
그 속에서 왜도 한몫 챙기려는 심산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나 가야제국-백제의 첫 교섭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2년 뒤 백제는 남쪽 가야 땅 일대에 군령(郡令)과 성주(城主)를 파견했다.
고구려를 막고, 신라의 노골적인 가야진출에 대응해 가야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이듬해 '2차 임나부흥회의'가 백제에서 다시 열렸다.
여기서는 △가야제국 보호를 위해 왜 군사력을 요청하는 일 △가야-왜의 교류를 막고 있는 백제의 군령과 성주를 내보내는 안건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 회의도 양쪽의 합일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로써 가야제국은 구심점을 잃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대가야는 가야제국을 아우를 힘을 잃고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편승해 때로는 신라, 때로는 백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551년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되찾을 때 대가야는 신라와 함께 백제 편에 섰다.
전쟁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 6군을 회복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했다.
대가야도 군사력 지원에 따른 대가를 얻었다.
그러나 2년 뒤 신라는 한강 하류의 백제군을 쫓아내고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뺏은 땅을 독차지해 버렸다.
554년, 백제가 신라의 '배신'에 대응해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 때 대가야는 왜(倭)와 함께 백제에 원군 수천 명을 보냈다가 몰살당했다.
대가야가 기울기 시작한 결정적 단초가 된 관산성 전투였다.
신라는 이 승리를 기점으로 한강 유역 일대를 완전 장악했다.
이듬해 신라는 비사벌(창녕)에 완산주(下州)를 설치했다.
곧이어, 가야제국을 잇따라 무너뜨리며 낙동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높였다.
대가야와 함께 400년대 탄탄한 세력을 뽐내던 안라국도 560년대 신라에 병합됐다.
561년 2월, 신라 진흥왕은 상당수 중신들을 데리고 창녕까지 순행(巡幸)했다.
가야 내륙 깊숙이 들어와 영토를 확인하면서 대가야를 위협한 것이다.
창녕 진흥왕 척경비(拓境碑)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신라는 여세를 몰아 가야 땅 곳곳을 누볐다.
562년, 급기야 신라는 장군 이사부(異斯夫)의 지휘아래 대가야로 쳐들어왔다.
화랑 사다함(斯多含)이 선봉에 선 기병 5천명이 도읍지 고령을 침공한 것이다.
신라 병사들은 망산(望山;錦山) 고개를 넘고 알터를 비껴 맹렬히 진격했다.
망산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했고, 대궐 근위병들은 미처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신라 군사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깊숙이까지 넘볼 줄 몰랐던 터였다.
도설지왕(道設智王)과 대가야 군사들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스러졌다.
'삼국사기'에는 "뜻밖에 신라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너무 놀라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승리한 진흥왕은 점령지에 대가야군(大加耶郡)을 두었다.
신라, 백제와 어깨를 겨루며 광대한 대륙을 누볐던 대가야는 그렇게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변한 반로국에서 출발해 짧게는 300년간, 길게는 500년 간 철과 토기, 농산물로 가야제국을 호령하던 대가야 왕국. 수백 년 왕국의 영광은 지산동 고분에 파묻혀 여태 그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김인탁(고령)기자 kit@imaeil.com
사진.안상호기자 shahn@imaeil.com사진: 철투구(옥전28호분·경상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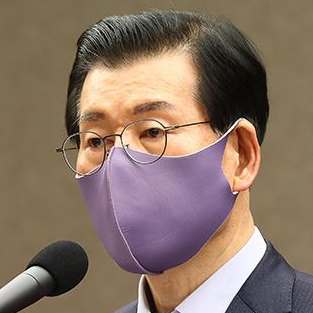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