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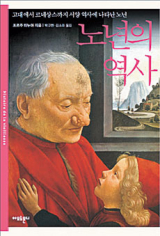
#노년의 역사/조르주 미누아 지음/박규현 · 김소라 옮김/아모르 문디 펴냄
역사에 비친 노년의 다양한 모습에 관한 이야기다. '고대에서 르네상스까지 서양 역사에 나타난 노년'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비교적 오래전 노인에 대한 평가이자, 동양이 아니라 서양 역사에 등장하는 노년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노인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모든 사회에는 노인이 있다. 각 시대, 각 사회는 이상적인 인간유형을 상정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노인의 가치를 평가했다. 그래서 노인은 존경 받고 부를 누리기도 했으며 천대와 멸시를 받기도 했다.
노인과 죽음을 처음 기록한 것은 창세기 5장 5절이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 죽었다.'
인간에게 노년의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기록된) 부분이다. 낙원의 아담은 영원히 젊고 아름다웠으나 순리를 어겨 노인이 되었고, 그는 노쇠함의 우울 속에서 노년의 비참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위치가 노쇠와 죽음과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록이다.
창세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저자들은 노쇠함에 죄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노인은 고행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죄인이며 반대로 젊음은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새로운 인간의 순수함으로 종종 묘사되곤 했다.
헤브라이즘 세계에서 노인은 신성함을 잃고 평범한 존재가 됐다. 기원전 4세기 말 이후 주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헤브라이즘 세계의 사고 속에서 노인은 늙고 병들고 왜소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위엄을 드높여 주던 노인의 긴 수명은 이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유죄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의 희극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냄새나고 잔소리 심하고 성가시고, 지저분하고 음탕한 노인의 유형이 유대 사회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늙음'이라는 신성함이 일단 인간의 차원으로 강등되자 노인은 허약하고 지저분하고 음탕한 존재로 전락했다. 당시 노인은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였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힘을 찬미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노인의 위상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노인들은 성격이 좋지 못하다. 그들은 최악의 면만 본다. 그들은 어디에서든 의심을 한다. 그들은 쩨쩨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삶에서 굴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매하고 경이로운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생활의 필요에 국한 시킨다. 그들은 극도로 인색한데, 그 까닭은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비루하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살며, 아름다움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들이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줍어하지 않으며 수치를 모른다. 이익만큼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중세의 노인들은 성수를 뿌리고 칼을 잡고, 괭이를 들고 셈을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직분을 수행했다. 그들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는 신체적 무력함이었다. 그들에게 '노년기'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삶과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에 관련된 일을 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각 시기에 해야 할 특수한 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15세기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노인에 대한 시선은 달라졌다. 한창 나이에 최고점에 달하는 전사(戰士)와 달리, 성공이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인에게 경력의 절정은 노년기였다. 상인의 가치란 무엇보다 햇수에 달려 있었다. 나이와 더불어 이익이 축적됐으며 동산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였던 반면, 부동산은 대개 가문의 소유였다. 다시 말해 가문 혹은 질서가 강할수록 노인은 대접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종교에서 많이 나타났다. 수많은 주교와 수도사는 매우 고령까지 살았다. 그 역할의 성스러운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치 세계의 암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했고 전염병이나 기근의 영향도 덜 받았다.
노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자 노인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비판적 풍자가 되살아났고 그리스 로마시대의 '노인에 대한 폄훼'가 다시 성행했다. 시인들은 '생의 장미'를 노래하며 젊음을 찬미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활발하게 활동했다. 70대의 제노바 해군 제독 도리아는 오스만 함대의 제독 바르바로사와 싸웠고 미켈란젤로는 89세, 티치아노는 99세까지 살았다.
남자와 달리 여자는 늙는다는 점에서 더욱 불리했다. 르네상스인들은 늙은 여성에 대한 반감이 대단했다. 실제로 여성은 극과 극을 체험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가 추함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요정에서 마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동화나 그림에 나오는 마녀는 늙은 여자이며, 늙은 여자는 언제나 심술을 부리고, 위험한 존재로 묘사된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노년은 언제나 과제였다. 이는 비단 서양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강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노인은 종종 '문제'가 됐고, 고려장과 같은 '축출'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어디에나 존재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우리는 노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는 공개적으로 '노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적절한 '숫자' 이상의 노인은 언제나 '사회적 짐'이었고, 지금도 그런 현실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노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달리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랐다. 노인들은 나이 먹은 것을 한탄하면서도, 노령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루라도 더 살고자 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신의 섭리라면, 그리고 노인이 결코 '인류의 짐'이 아니라면, 신이 노인에게 부여한 가장 마땅한 역할을 인류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560쪽, 2만4천원.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