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의 여왕'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오인 받아 외딴 섬 마르티니크 감옥에 수감됐던 어느 한국인 주부의 애절한 사연이다.
누명을 쓰고 말 한마디 통하는 사람이 없는 타국의 감옥에서 2년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 그토록 갈구하던 법정에 서서 가까스로 한 말이 심금을 울린다.
그것은 "남편에게 아내를, 아이에게 엄마를 돌려주세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나오자 "저 그냥 집에 갈래요"라고 울먹인다. 이 영화의 제목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장면이다.
독일의 언론인 마리자겐슈나이더가 지은 책 '재판'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재판에서부터 금세기의 O. J. 심슨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 재판의 법정 공방전을 통해 권력과 양심의 행방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서 '정의'란 시대에 따라 또 계층과 계급에 따라 혹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이렇게 재판은 한 개인의 인생행로는 물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그 단적인 예다. 배가 고팠던 그가 단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고한 시민을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기소해 25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미국의 한 전직 검사가 10일간의 징역형과 5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느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을 배상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범생 출신인 판검사가 피고인을 보는 시각은 일반인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유'무죄에 대한 판사와 변호사의 인식도 서로 다르다. 변호사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으랴. 죄를 묻는 것도,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인생살이던가. 길고도 추운 겨울, 교도소의 담장은 더욱 냉엄하다. 더구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혹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오로지 '집으로 가는 길'만을 그리는 사람이 없기를 빌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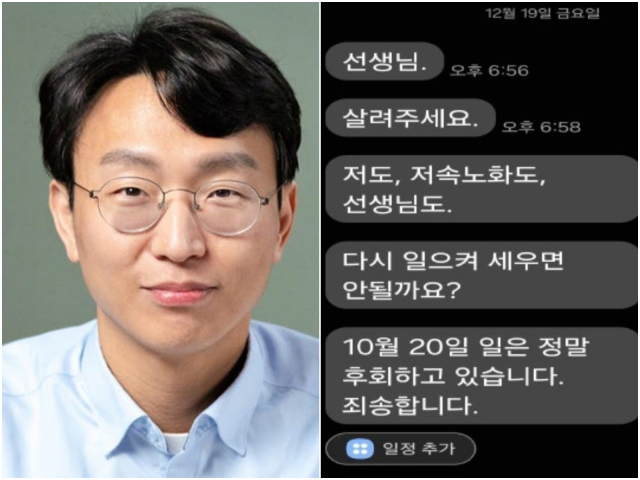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