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처럼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사직하는 마음은 유연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서 떠났다. 새로운 레일에 몸을 싣듯이. 한국 직장생활 9개월 만이었고 2011년 3월 중순이었다.
이틀 전에도 면접을 봤고 하필이면 골라잡은 직장은 먼 산골에 자리했다. 직업소개인은 굳이 열차를 타라고 했다. 열차를 타면 더 가까운 줄로만 알고 출발했다. 동대구 환승역에서 갈아타면 안동역에 도착하고 다시 시골 동리행 버스에 올라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먹고사는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날 열차 여행은 왜 그리 지루하던지. 이른 봄 창 밖 풍경도 내 마음만큼이나 스산했다.
동대구역에 이르러 환승 열차가 올 때까지 서성이는데 장에 갔다 오시는지 작은 꾸러미를 묶어 짐수레를 곁에 놓고 의자에 앉아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연세 지긋해도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 보였다. 나는 그 곁에 마찬가지로 짐을 내려놓고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지나가는 인사처럼 "이번에 오는 기차가 어디 행이지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야-" 하고 대답하시더니 되물으셨다. "어야, 가시더? 새마을호 아니모 구마을호 있시더." 나는 정다운 토박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 참고 "네, 저 올 때는 새마을호를 타고 왔고 안동에 갈 건데요. 그런데 구마을호란 기차도 있나요?" 하고 얼른 대답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역시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신나게 대답하셨다. "그라모, 고것은 표 값두 영 헐터만. 처음부텀 갸를 타가 더 좋았을기더…."
할머니가 즐거워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하고서야 나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새마을호 열차보다 표 값이 저렴한 무궁화호를 구마을호 열차로 굳이 연상하시는 할머니, 말 한마디 걸어 드린 것이 반가운지도 모른다. 낯선 외국손님의 자기 고장 행차에 좀이라도 보탬을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알음알음이고 좋은 정보라도 알려주신 듯 목청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에겐 훈훈한 인정이기도 했다.
그때 기차가 다가왔으므로 나는 꾸벅 인사를 올리고 나서 짐을 끌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어쩐지 걸음도 가볍고 달팽이처럼 짐에 매인 몸도 날렵했다. 자리를 찾아 앉으니 자애롭고 환하게 웃으시던 표정의 할머니 모습이 창에 어른거렸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뿐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가는 곳의 사람들도 마냥 순수하고 사람 냄새 가득 넘쳐날 것 같았으며 직장도 마음을 안착하면 즐겁게 살아갈 방법이 나타나리라. 내가 취직하려는 직장은 낯설어도 적당히 할머니 같은 경북사람들 온기도 느낄 것이라 죽치고 꾸준히 살아볼 터였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신심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느긋하게 의자등받이를 젖히고 창 밖 풍경을 보면서 나는 기어이 취직 면접을 잘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나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무난히 취직이 되었다. 그 후 다시 동대구행 환승역을 거치면서 혹시 완행열차를 기다리던 그 할머니를 또 만나지 않을까? 그날 열차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던 '구마을호' 다음이었다면 짐을 도와 실어 드릴 수 있었을 여유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그 많던 터널을 지나는 열차도 더는 지루하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비쳐 더는 싫지 않기만 하던 기억들.
퇴사도 있고 취직도 있는 삶은 환승역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다시 사직을 하든, 새로운 취직을 준비하여 면접을 가든, 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간이역처럼 힘든 인생살이와 역경 속에 더는 슬퍼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으리라.
나도 나 자신의 삶에 솔직하고 충실해지리라 다짐했다. "할머이요, 저도 앞으로 쭈욱 기차를 즐겨 탈 끼고 한국서 살 거이니 잘 봐주심더."
류일복(중국동포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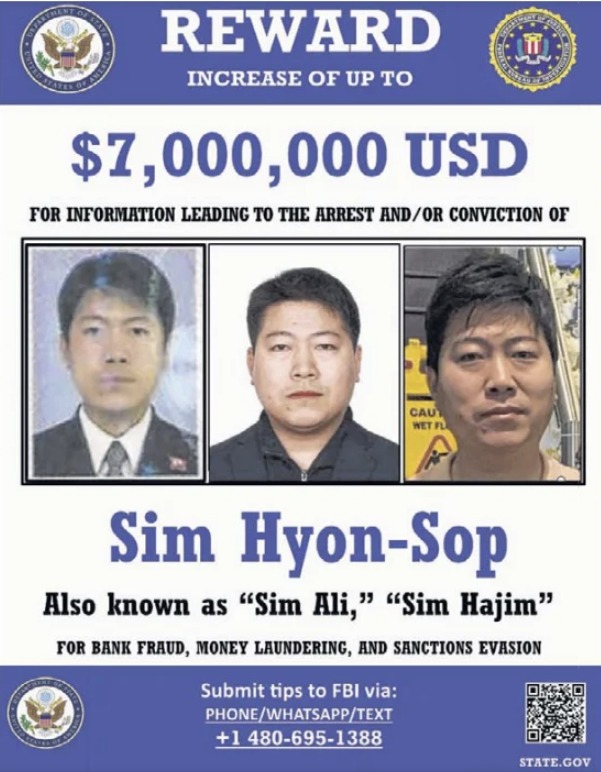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이혜훈 장관' 발탁에 야권 경계심 고조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대통령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만에 이만큼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