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문 후보자 자신과 청와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대한 재가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늘 이후로 미뤘다. 사실상 자진하여 사퇴하라는 메시지다. 그러자 문 후보자는 19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퇴 불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사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추락하고 그만큼 국정 장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뒤 이런 사태를 일으킨 원인의 규명과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확실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뜻이 자진 사퇴에 있다며 '분위기'를 잡아가는 '외곽 때리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자인 만큼 사퇴시킬 이유가 생겼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후보자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 그는 "내가 총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총리를 하라고 불러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세는 비겁 그 자체이다.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검증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을 책임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꼼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자세는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 후보자 개인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태도는 나는 뒤로 빠질 테니 알아서 자폭하라는 전형적 책임회피다.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어느 누가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오늘 귀국하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진솔한 사과가 도리어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임을 박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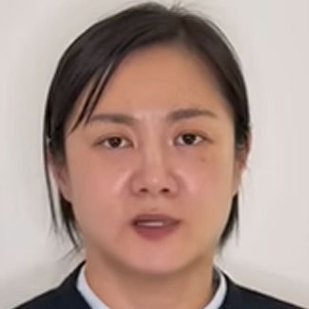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