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 의류노동자 1만5천 명은 열악한 작업장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시위에 나섰다. 노동 조건 개선, 여성 지위 향상과 참정권을 외쳤다. "우리가 행진할 땐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네.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지. 그런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굶주리네. 우리에게 빵을 달라, 또한 장미도!"라는 노래를 불렀다.
빵은 생존권,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당시 여성들은 최악의 노동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시위는 의류노동자연합 창설과 남녀 차별 철폐, 여성의 자유, 참정권을 촉구하는 여성 운동으로 이어졌다. 1977년 유엔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이날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린다.

여성에게 선거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불과 한 세기 남짓하다.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적 능력이 낮고, 가정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하면 그들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는 논리로 참정권이 거부되어졌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처음 시작된다. 여성을 단두대에 보낼 수 있다면, 투표 참여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성들과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8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1870년경 무려 30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빅토리아 여왕의 반대로 좌초된다.
계속되는 청원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좌절한 여성들은 여성 참정권 연맹의 에머린 팽크허스트(1858~1928)의 선도하에 전투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당과 의회의 회합을 방해하고 경찰에게도 맹렬하게 대항하며 체포된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우리는 범법자가 아니라, 새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에 섰다. 나는 노예가 되느니 반란자가 되겠다"며 당당했다. 과격한 시위에도 정부의 반응이 없자 여성들은 남성들의 상징적인 건물들의 방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1년에 12차례나 투옥과 단식을 반복하였고, 경찰서마다 여성 시위자로 넘쳐났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남성이 전쟁터에 투입되자 여성들이 그들을 대체하여 중요한 산업 인력이 되었다. 에머린과 동료들도 참정권 운동을 일절 중지하고 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제야 국민들과 의원들은 이들 여성운동가들의 애국심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그녀들을 받아들였다. 전쟁이 끝난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1928년 에머린이 죽기 직전에는 21세 이상의 영국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참정권을 얻었다.

이 도도한 표정의 황동종의 인물이 딸 크리스터벨과 함께 여성의 존엄성을 찾아주는 참정권 운동에 일생을 바친 에머린 팽크허스트다. 그녀를 마치 당당한 어느 외계인 같이 묘사했다. 1930년 이 종을 조각한 장인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인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남성 위주의 독점적 사회구조의 종말을 알린 그녀의 족적에 대한 질시를 함께 담은 것 같다. 그녀는 "우리들은 인류의 절반을 해방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고, 결국 그 숭고한 목적을 달성했다.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장미를 안겨준 거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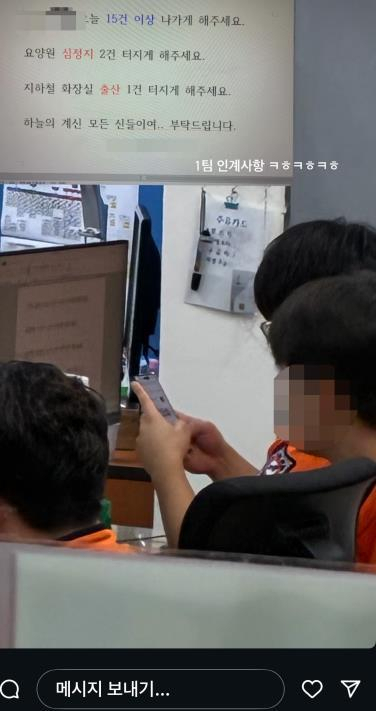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