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배움의 길은 연연 좁아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문은 열릴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문으로 어린 아동들의 뼈아픈 문이 되어 낙방한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배움의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장래를 방황하고 있음은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이 땅 소국민의 특이한 고민일 것이다.'(매일신문 전신 남선경제신문 1949년 12월 11일 자)
초등학교에서 과외수업이 성행했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별도의 수업을 한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가 컸다. 게다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자질은 안중에 없었다. 예체능 과목은 정규 시간에조차 무시되기 일쑤였다. 급기야 교육 당국이 나섰다.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없앨 수는 없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대신에 과외수업 시간을 줄였다. 하루에 1시간은 넘지 말도록 했다. 학교를 쉬는 공휴일에는 과외수업을 금지했다. 정규수업도 시간표를 지키도록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린 아동들의 뼈아픈 문'에 그 곡절이 숨어 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의 초등학교 졸업생은 3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 정원은 20%에 불과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실패의 참담함을 감당해야 했다.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대구부 내 초등학교의 입학 정원은 2천300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방 후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동들의 뼈아픈 문'은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많은 바늘구멍 같은 중학교 입학 문을 가리켰다.
입시 전쟁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시작됐다.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로 불린 초등학교 입학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는 그보다 몇 배 더 어려웠다. 당국은 야간중학 개설과 학교 신설로 입학생을 늘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런 와중에도 여자중학은 야간학교 개설에서 제외되었다. 대구에는 경북중학, 대구중학, 대구농림, 대구상업, 계성중학, 대륜중과 경북, 신명여학교 등이 있었다. 그 뒤 능인중이 설립됐고 효성여중은 대건중에서 분리되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합격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후원회비, 월사금, 입학금, 후생비 등 내야 할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2만원 남짓의 입학수속금이 정해져 있었다. 애초 지켜질 수 없는 액수였다. 학교 운영 경비의 상당 액수를 교육 당국의 지원 대신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했다. 이 밖에 서적, 교복 등의 구입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얘기는 빈말이 아니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은 비리를 불러왔다. 입학을 미끼로 현금과 쌀 한 가마를 받은 교사가 붙잡히는가 하면 시험지를 빼내 팔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허위로 학생 모집 광고를 내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령학원도 등장했다. 향학열에 불타는 어린이를 가진 가정은 주의하라는 당국의 담화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수업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학교조차 마음껏 못 가는 지금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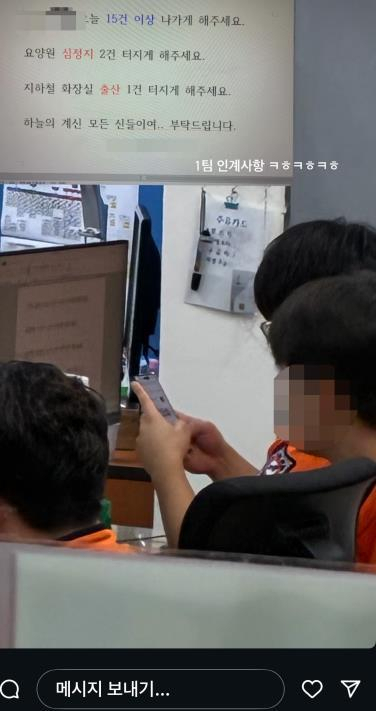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