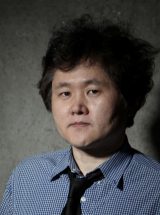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지난 8월 끄트머리, 대구 도심에서 제26회 대구단편영화제가 열렸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상영된 68편의 작품이 전하는 울림과 열기는 웬만한 국제영화제 못지않았다. 각 단편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삶의 단면을 포착했고, 상영 뒤 감독과 배우, 관객이 함께 작품의 숨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단편영화만의 매력을 오롯이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단편영화는 상영시간, 제작비, 장르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술 형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편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지거나, 영화 관련 학과의 졸업 작품 또는 공모전 출품작으로 기능하면서, 창작자의 개성과 실험정신이 제도적 틀에 갇히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창작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소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구단편영화제는 각별하게 다가왔다. 비록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대형 영화제는 아니지만, 창작자와 관객이 지역 공간에서 긴밀히 호흡하며 영화를 '소통의 예술'로 경험하는 구조는 인상 깊었다. 특히 지역 작가와 카페가 연계한 영화 포스터 전시, 동네 가게의 자발적 후원,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 등은 단편영화가 담아낼 가능성을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을 공공 주도의 영화제나 기금에만 기대거나 맡겨 둘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작고, 더 자유로운 시도들이다.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소규모 단편영화제는 대형 조직이나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빠르게 실험하고, 더 가까이 관객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축제들이 늘어날수록 단편영화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소규모 독립 단편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열린 플랫폼이 되는 일이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다음으로, 관객과의 교류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영화는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대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성과의 연결을 통해 '로컬 이야기'의 힘을 되살려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삶의 목소리, 작지만 진솔한 일상의 감각들이 단편영화라는 형식 안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
'작다'라는 것은 결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아서 더 진실하고, 밀도 있는 창작이 가능하다. 대구단편영화제가 보여주었듯,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며,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단편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려가는 작은 영화제들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때, 단편이라는 형식은 작지만, 단단한 이야기로 살아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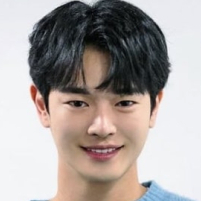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