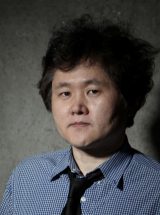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춘천에는 한때 입소문이 자자했던 하숙집이 있었다.
오랜 세월 한식당을 운영하다 남편을 여의고 하숙을 시작한 아주머니. 수수한 반 양옥과 좁다란 마당, 그리고 대강 차린 밥상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밥상이, 누구는 "한정식 수준"이라 말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내는 밥상은 대단하진 않았지만 늘 정갈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맛있었다'.
사람들은 그 맛의 비결을 '손맛'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손맛이 아니야. 입맛이지. 먹는 사람이 맛있어야 진짜 맛이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먹는 이의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헛일이야."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 한식당을 지켜온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의 비결을 '손맛'에서 찾는다. 정성과 경험, 따뜻한 마음까지 담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어딘가 약간은 일방적이다.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나 감각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하숙집 아주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맛이란 결국 입맛의 일치에서 생긴다는 것, 아무리 좋은 재료와 뛰어난 기술이라도 상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 철학은 밥상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지만, 재료는 늘 제철에 맞았고, 조리는 담백했으며, 간은 슴슴했다. 하숙생 한 분이 "된장찌개가 좀 간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다음 날 아침상엔 간이 조정되어 나왔다. 입맛이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입맛과 손맛,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이 질문은 단지 요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술, 디자인, 서비스—모든 창작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창작자의 감각이 우선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소비자, 즉 관객의 반응이 본질인가. 창작자의 손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모든 창작은 누군가의 입맛에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물론 그 입맛에만 맞추는 것은 답은 아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밥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제철 재료를 고집했으며, 간은 늘 절제돼 있었다. '다수의 입맛'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맛이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입맛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금도 찬 바람이 불면 문득문득 그 따뜻하고 행복한 밥상이 생각날 때가 있다.
"손맛이 아니라 입맛이야."
음식을 넘어, 그 말은 관계의 기술이자 삶의 태도처럼 들린다. 나만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 함께 어우러지는 감각. 어쩌면 맛있는 인생도 그런 조화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댓글 많은 뉴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한동훈 "윤석열 노선 끊어내야"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설 자리 없어…'朴·尹·대한민국 잡아먹었다'더라"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