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蕩減)해 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채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에 새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인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消却) 또는 채무조정돼 11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득과 자산을 심사해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상환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은 전액 소각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외에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一括) 매입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6조7천억원가량 연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하다. 대부업체들은 정부 제시 매입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대부업체들은 보유 연체 채권의 매입가가 액면가의 최소 25% 수준인데, 정부 제시 매입가율은 5%여서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대부업계 동참이 없으면 정부가 생색만 내고 성과는 빈껍데기일 가능성도 높다.
도덕적 해이(解弛) 논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회사는 대출자 업종만 파악할 뿐 생활고로 빚을 냈는지 여부는 알아낼 수 없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대상자 중 절반이 주식·선물·코인·부동산 투자 때문이고 생활고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면서 세심한 설계나 검토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탓에 논란과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용 사면과 빚 탕감 조치를 해 주다 보니 재연체 비율도 높다. 당장 연체율을 낮추기에 급급하기보다 책임 있는 구제(救濟)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해야 한다. 대규모 부실채권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다.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되 철저한 선별 과정과 채무 상환 책임도 명확히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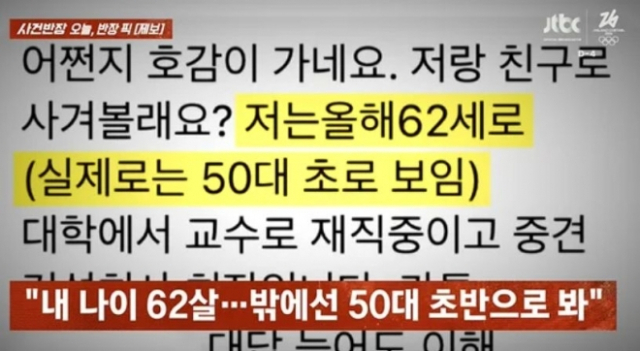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