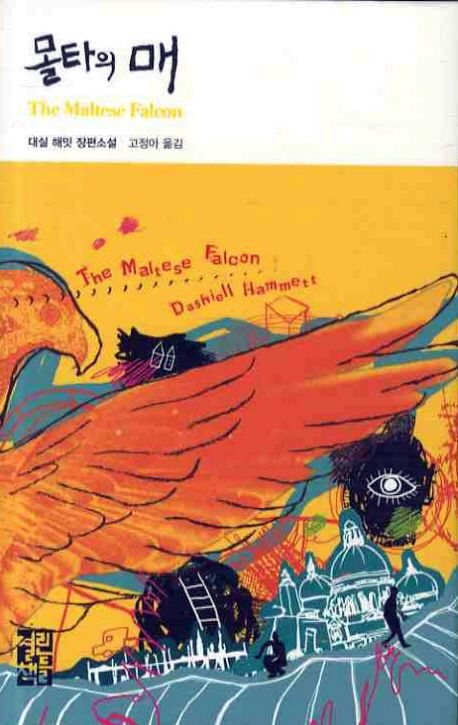
잡스런 얘기 두 개로 시작하자. 하나, 책 제목이 '몰타의 매'이다. 영화 '말타의 매'를 먼저 본 내게 몰타의 매는 생소했다. 당연히 말타의 매로 출간된 버전도 있다. 여전히 말타의 매가 기억하기도 말하기도 편하다. 둘, 영화사상 최고의 데뷔작 중 하나인 존 휴스턴 감독의 '말타의 매'. 필름누아르의 효시로 꼽히기도 하는 이 작품이 그 정도로 대단하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원작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 284쪽의 적지 않은 분량을 110분에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샘 스페이드의 브이(V)자형 생김새와 톡톡 쏘면서 대화할 때의 이죽거리는 입모양과 냉소 가득한 표정은 험프리 보가드에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소름 돋을 정도의 싱크로라니. 혹자는 원작대로 찍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원작에 못 미친 영화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원작을 넘어선 영화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원작을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되는지부터 생각해볼 일이지만). 요컨대 원작의 상상력을 깨뜨리지 않고 디테일을 살리면서 서사의 흐름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군다나 1940년대라면 말이다.
하드보일드 문학의 선구자 대실 해밋의 '몰타의 매'는 검은색 매 조각상을 둘러싼 거짓과 음모와 배신과 협잡에 관한 이야기다. 한 마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란 얘기. 작가는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셈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탐정 샘 스페이드를 등장시킨다. 대실 해밋은 핑커톤 탐정사무소 출신이다. 이를테면 남의 뒷조사를 하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헤집고 다닐 바엔 경험담을 소설로 펴내리라 마음먹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터.
셜록 홈스와는 다른 유형의 해결사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문. 몸으로 부딪히며 위험에 노출된 육체노동자 같은 탐정의 탄생은 1차 대전 이후 기업화 조직화되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수사전문기관이 필요해진 환경과 무관치 않다. 곧 대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한 하드보일드가 탐정의 마초성을 긍정하는 것, 샘 스페이드가 자비심 없는 미국식 마초의 전형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드보일드 소설 뿐 아니라 필름누아르 영화의 클리셰가 된 '팜므 파탈'은 원덜리 양에서 르블랑을 거쳐 오쇼네시로 이름을 바꾸어 등장하는데, 팜므 파탈의 역할이란 '남성주인공이 쉽게 극복하기 힘든 불가항력의 대상'으로 그려짐으로써 마초 탐정의 도덕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거나 타락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기능할 뿐이다.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고 성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노출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설사 타락 직전까지 갔다 해도 그건 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상대가 팜므파탈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대실 해밋은 어쩌자고 긍정할만한 구석 하나 없는 탐정을 내세웠을까. 동료 아처의 부인과 내연관계이고 여비서를 수족처럼 다루면서도 다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속물을 말이다. 허위와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군상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1920년대 미국의 초상 '몰타의 매'. 도덕적이진 않아도 최소한 악당보다는 나은 인물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샘 스페이드가 이기적이면서 냉소적인 인간인 건 맞지만, 세상은 악당으로 가득하고 여성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거늘, 뭘 더 어쩌란 말인가.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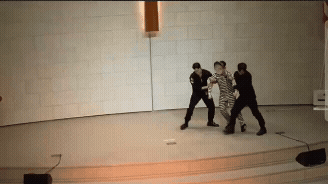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르포] 구미 '기획 부도' 의혹 A사 회생?…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
"韓 소명 부족했고, 사과하면 끝날 일"…국힘 의총서 "당사자 결자해지"
[사설] '정치인 한동훈'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