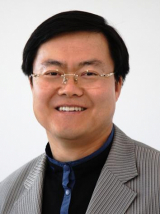
죽장에 삿갓 쓰고 삼천리강산을 표류했던 김삿갓. 사대부가의 후손으로 글재주가 탁월했던 그가 입신양명은 물론 처자식까지 버리고 방랑길을 떠나게 된 것은 향시(鄕試)에 장원급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시제(試題)가 홍경래의 난 때 반란군에 항복한 고을 수령을 탄핵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친할아버지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얄궂은 운명이었다.
문전걸식으로 떠돈 김삿갓의 행로는 처연했지만 남긴 시(詩)들은 해학과 풍자를 넘어선 어떤 경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아향청산거(我向靑山去) 녹수이하래(綠水爾何來)'란 구절은 다분히 불교적인 풍미를 지녔다. '나는 청산으로 가는데, 녹수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어쩌면 구도자의 심오한 화두(話頭)에 다름아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라는 우리네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법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명예도, 돈과 권력도, 사람과 생각도 그렇다.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토록 무상한 것들을 천년만년 가질 수 있을 듯 집착하니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즉 일체개고(一切皆苦)이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대상은 고정된 실체 또한 없다. 무슨 직업을 가지거나 어느 지위에 오르면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는데, 그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직위도, 어떤 것들도 고정불변한 실체적인 것은 없다는 게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인 것에 집착하며 괴로움(苦)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 수행도 하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는 명산유곡마다 크고 작은 사찰들이 흩어져 있다. '부처님오신날' 모처럼 절을 찾아 산길을 오른 사람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모았을 법한 사유(思惟)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