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여름날 낮잠'이다. 녹음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긴 평상 위에 수염이 멋진 나이 지긋한 어떤 분이 커다란 둥근 안석(案席)에 팔을 얹고 기대 잠들었다. 발치에 부채가 하나 있고 잠결에 한 발은 땅에 떨어졌다. 뒤쪽으로 보이는 난간은 고급 주택의 전망 좋은 누대임을 말해주는 화보(畵譜) 풍 배경이다. 이 낮잠이 그냥 일상이었다면 그림으로 그려졌을 리 만무하다. 옛 그림에서 낮잠은 고도의 문화적 행위이다. 술과 잠을 의도적 외면으로 기호화한 중국 송나라 소동파의 시 '취수자(醉睡者)'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잠은 인체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밤잠이 아니다. 시는 이렇다.
유도난행불여취(有道難行不如醉) 도가 있어도 행하지 못한다면 술에 취하는 것만 못하고
유구난언불여수(有口難言不如睡)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면 잠자는 것만 못하네
선생취와차석간(先生醉臥此石間) 선생은 술에 취해 이 바위 사이에 잠들었는데
세상무인지차의(世上無人知此意) 세상에 이 뜻을 아는 사람 없다네
아마도 잠 보다 술이 약간은 심한 강도일 테지만 둘 다 어찌할 수 없는 심정의 소극적 저항이자 달관일 뿐이다. 이 시의 취수선생은 술에 취해 잠들었으니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했다고 하겠다. 눈 감고, 술 취할 수밖에 없는 취수선생의 심정에 공감한 우리나라 사람도 많았다. 취수(醉睡), 수거사(睡居士), 취면선생(醉眠先生) 등을 호로 삼기도 했고 취수헌(醉睡軒), 취수당(醉睡堂), 오수당(午睡堂) 등을 당호로 삼았다. '낮잠 자는 집' 오수당은 단원 김홍도의 당호이다. 낮잠에 관한 철학적 시는 무척 많다.
해남 윤씨 종가에 전하는 이 그림은 윤두서의 정밀한 필묘(筆描)를 잘 보여준다. 살집이 적당한 두툼한 얼굴과 코, 꼬리가 위로 솟은 눈썹과 수염을 다듬은 방식 등이 그의 '자화상'과 닮아 그 자신의 모습일 것 같다. 뛰어난 재능과 포부를 지니고도 당쟁으로 치군택민(致君澤民)의 도를 실천할 수 없었던 윤두서의 일생 또한 유도난행(有道難行)이었다. 그의 재능은 어쩔 수 없이 화가로 발휘되어 이런 명작을 낳았다.
눈을 감았으나 기개 있어 보이는 얼굴, 우아한 손가락, 버선을 벗은 맨발은 격조 있는 섬세한 필선이고, 옷자락은 속도감 있는 빠른 필치이면서도 굵고 가는 리듬을 살린 가운데 이어짐과 멈춤에 공감이 가는 자연스러운 필선이다. 인물을 묘사한 선과 옷자락을 묘사한 선이 주(主)와 부(副)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주인공의 존재감, 주변의 소도구, 배경의 수목과 난간 등이 다양한 선질(線質)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격(古格)의 품위가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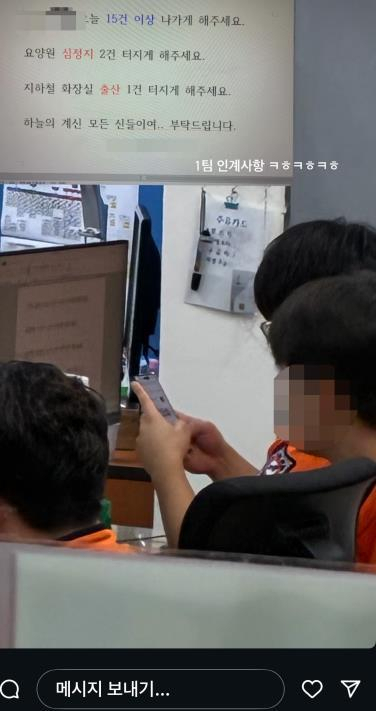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