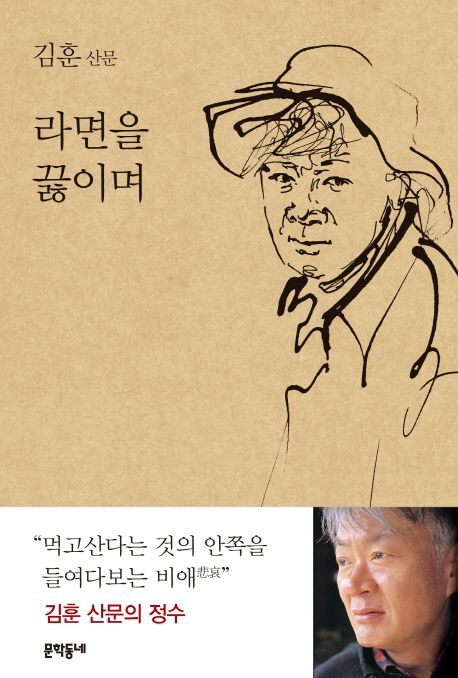
딱히 산문을 싫어한 건 아니었다. 산문에 악감정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산문은, 에세이는 잘 안 읽혔다. 애써 읽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테다. 이유는 간단하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며 살아온 과정이 다른데도 자기 경험을 보편화하려고 안간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말하자면 내 삶과 네 삶은 다르다는 엄연한 진실. 나는 그 앞에서 늘 한 발 물러서곤 하였다. 한편으로 인생을 제대로 통찰한 산문을 늘 그리워했다. 다양한 형식으로 포장된 산문의 창궐 속에서 나는 단 하나면 족하다고 여길만한 책을 만났다. 빈말도 농담도 아부도 아니다.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이다.
'라면을 끓이며'는 제목처럼 직관적이고 실존적이다. 책은 총 5부로 되어있는데 1부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의 예고편에 가깝다. 작가가 세상을 바라본 프리즘은 시간이었다. 라면은 산업화의 시간이고 국경은 정서와 질서로 고착된 분단의 시간이며 선양에서 단동으로 오는 길은 연암 박지원의 시간이다. 김훈이 자기 생을 완고한 가부장이던 글쟁이 아버지의 신산한 삶을 가부장이 된 자식이 되짚는 시간이라 고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멀거나 큰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먼 것들은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자를 눈멀게 한다."(94쪽)고 갯벌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선 공간에서 시간을 탐조하는 김훈의 통찰이 드러난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상 문학상 수상작 '화장'의 모티브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3부 '몸'이다. 특히 '화장'에서 추은주를 묘사하는 장면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작가는 일부 여성들에게 반감을 살법한 이야기, 즉 '여자'라는 소제목의 꼭지를 7편이나 쓰면서 여성의 몸을 샅샅이 살핀다. 여자의 냄새와 화장과 유방성형과 노출패션과 아줌마와 성적수치심에 관한 생각이 심수봉에 이르면 피식 웃음이 나오다가(이러니 일부 여성들이 김훈을 싫어하지) 무릎을 치는 지경.
4부 길은 어느 해 여름, 길에서 만난 사람과 사물들에 관한 이야기다. 터전을 잃은 사람과 길을 잃은 고개를 생각하고, 포항제철에서 신라와 가야의 대장간을 떠올리며 작가는 쇠의 시대를 흠모한다. "쇠는 단단함으로써 부드럽고, 쇠의 날은 날카로움으로써 섬세하다."(342쪽)면서 양극단의 모순을 지향하는 쇠의 시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사람. 해외여행에서 펜치 망치 톱 같은 연장을 사들고 오더니 치과의사의 연장에서 쇠의 낙원을 발견한 사람이 김훈이다.

가장 짧지만 더없이 강렬한 5부를 통과하면 마침내! 마지막 꼭지이자 이 책의 압권 '1975년 12월 15일의 박경리'와 만난다. 작가는 국가보안법 내란죄로 복역한 김지하가 영등포교도소에서 나오던 날을 스케치하면서 김지하도 박형규도 백기완도 아닌 김지하의 장모 박경리 선생 품에 안긴 갓난아기(김지하의 장남)에 초점을 맞춘다. 시대도, 긴급조치도, 국가보안법도, 또 뭐도 아닌, 사람 말이다. "나는 잠자다 일어난 아내에게 그날의 박경리에 관해서 말해주었다. 아내는 울었다. 울면서 '아기가 추웠겠네요'라고 말했다. 춥고 또 추운 겨울이었다."
김훈이 '라면을 끓이며'를 낸 건 그의 나이 67살 때다. 모름지기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면 그 세월만큼 살아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5년 후쯤이면 나도 제대로 된 산문 하나를 쓸 수 있을까.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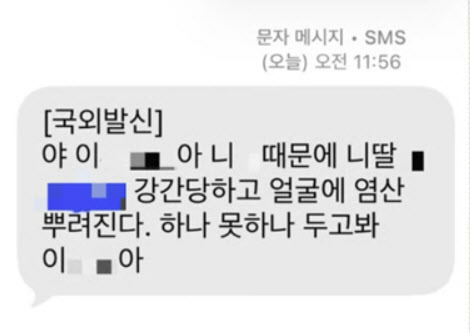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https://www.imaeil.com/photos/2026/02/05/2026020517375601025_l.jpg)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사당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