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0년 동안 야당에 머물면서 '인사' 요인이 쌓이고 쌓였는데 정권 탈환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서다. 이미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만찬에서 인사 적체 해소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에 여권 인사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이 장악하는 적폐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런 조짐은 여러 군데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부터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정치권 인사 중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진 하마평에 올랐다가 막판에 배제된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라거나, 민주당 전 의원들이 3년 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과거에 활동했던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공공기관장 자리를 타진하고 있다는 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전체 국민의 소유인 공공기관을 '논공행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관행의 끈질긴 생명력을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조직 이기주의,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정통성 부족 때문에 노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대선 공신을 위한 낙하산 인사는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정작 가장 큰 적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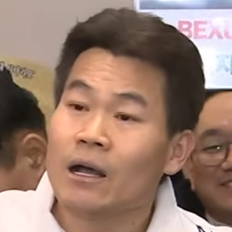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