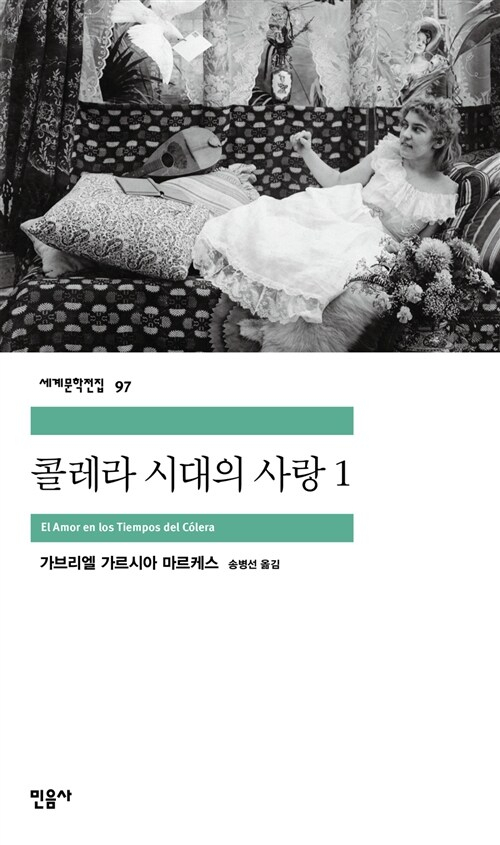
헤어진 날로부터 51년 9개월 4일 후, 사랑하는 여자가 미망인이 된 첫 날 다시 나타나 사랑을 맹세한 남자와 남편 1주기에 마음을 연 여자의 장대한 여정을 그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세월과 죽음을 이겨낸 러브스토리'라는 주제답게 시작부터 사랑타령이다. "여기서는 사랑 때문에 미쳐서 죽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 자네는 며칠 내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걸세."(1권. 13쪽)
"오십 년 후 페르미나 다사가 혼인 성사의 선고문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는 자비를 베풀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수많은 일회성 사랑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사랑만을 적은 공책을 25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622개의 사건이 기억되어 있었다."(2권. 267쪽)
자그마치 622명이다, 매달 1명 이상의 각기 다른 여자와(일회성 사랑을 제외하고) 50년 동안이나 연애를 일삼아놓고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기다렸다는 이 사내의 진심을 믿으라고? 심지어 그는 페르미나 다사와의 첫날 밤 "당신을 위해 동정을 지켜왔던 것"(2권 315쪽)이라고 말한다. 페르미나도 다를 바 없다. 남편 장례식에 온 플로렌티노 아리사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녀가 그와 한 침대에 누운 뒤 "마침내 그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2권 317쪽)는 과정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라면 능히 가능한 일이죠, 라고 답할 것이다.
마르케스의 책이 난해하거나 종잡을 수 없는 건 만연체 작법과 시간이 겹쳐지는 다중회상 방식으로 종횡하기 때문일 터. 플로렌티노 아리사의 고독을 위로하는 서사가 특이하고 황당할지언정 마술적 리얼리즘의 특질로 보면 이상할 게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감수성 또는 신념의 토대 위에 수립된 것들을 소환하는 방식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플로렌티노가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한 눈 팔지 않고 페르미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사랑한다는 환상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프랑코 시대를 경유할 수밖에 없듯이 마르케스 배후에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역사가 숨 쉬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마르케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남자들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고독의 소유자였다. 유령처럼 죽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되돌아온 사내들(독재자를 포함해)은 곧 마르케스 소설의 중요한 질료가 되었다. 그러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아요"(2권. 76쪽)라던 페르미나의 말은 훗날 플로렌티노의 재등장을 예고한다.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한눈 팔다가 정신 차리고는 기어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질긴 생명, 플로렌티노는 라틴아메리카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53년 7개월 11일의 낮과 밤을 기다려 마침내 페르미나와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 언제까지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 믿느냐는 선장의 물음에 플로렌티노가 답한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붙이는 마지막 문장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책장을 덮고도 혼란스러워하는 내 귓가를 맴도는 어떤 목소리. 너무 따지지 말게, 여기는 라틴아메리카잖나!
영화평론가



































댓글 많은 뉴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 찾은 한동훈 "윤석열 노선 끊어내야"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진숙 "한동훈, 대구에 설 자리 없어…'朴·尹·대한민국 잡아먹었다'더라"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