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시 '귀천' 중)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일기 중)
천상병과 프리다 칼로는 장르는 달라도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나 시선을 끄는 건 둘 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점이다.
천상병 시인은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 그 기간에 전기고문을 당해 심신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로 말미암아 창작활동은 물론 일상생활마저 파탄지경에 빠졌다.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한다. 그 하나도 벅찬데 18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골반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 후유증으로 죽을 때까지 거동이 불편했다. 척추 수술 7회를 포함, 총 35회의 수술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문란한 생활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니 말을 말자.
"선배님은 운명을 믿으세요?" 내가 글 쓰고 있는 카페로 놀러온 Y가 그렇게 물었을 때 천상병 시인과 프리다 칼로가 떠올랐다.
운명은 무거운 아니, 무서운 말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었으면 슬쩍 화제를 돌렸겠지만 Y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렇게 물은 Y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었다. 기실 Y는 지리멸렬한 내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Y는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죽은 지 일 년도 안 돼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다. 지금은 남은 아이를 위해 말 그대로 '살아 내는 중'이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이럴 때 말이란 얼마나 공소한 것인가. 쉬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명치 끝에 납추를 매달고 사는 후배가 보기에 난 너무 가볍고 한가한 사람이다. 내가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은 기름방울처럼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얼룩으로 화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후배가 떠날 즈음에야 한마디 했다. "'운명은 화살이 이미 꽂힌 자리 주위에 그려 넣는 과녁일 뿐'이라는 말이 있어."
잠시 내가 건넨 말의 의미를 생각하던 후배는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떠났다. 그건 에르베 르 텔리에가 쓴 소설 '아노말리'에 나오는 말이다. 남의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 내 처지도 딱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나저나 내 화살은 어디에 꽂혀 있지? 한동안 과녁을 그렸다 지웠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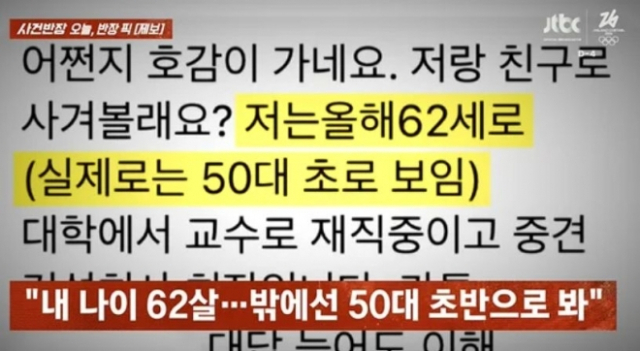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