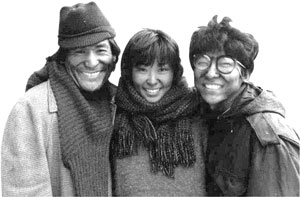

소설가 최인호가 지난 9월 25일 영면했다. 이 문장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1970년대에서 시작해 1980년대를 경유했던 이들이라면 최인호를 '모르면 간첩'이다. 물론 최인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활동했지만, 누가 뭐래도 최인호의 화려한 전성기는 역시 1970년대이다. 그는 당시 풍미하던 '청년문화'의 기수였다. 유신 시대라는 암흑한 시기에, 억압받던 당시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고 대중소설을 읽었으며 생맥주를 마시고 통기타로 포크 음악을 향유했다. 뚜렷이 구분되는 그들만의 문화. 그 문화를 통해 그들은 나름의 시대적 저항을 하고 있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우상이 최인호, 양희은, 김민기, 이장희, 서봉수 등인데, 연예인이 아님에도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 이가 바로 소설가 최인호였다. 그의 소설은 출간되는 즉시, 아니 신문에 연재될 때부터 대중들의 거대한 사랑을 받았고, 출간되자마자 그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언론의 중심에 있었다.
최인호의 인기 소설을 당시 영화계가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다. 그의 소설은 바로바로 영화화되었다.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 '별들의 고향'은 이장호가 최인호를 자양분으로 해서 스타 감독으로 발돋움한 경우이다. '별들의 고향'의 엄청난 흥행은 당시 사회적 현상이 될 정도였다. '경아'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에서 대명사가 될 정도였고, 영화의 주제곡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는 당대 최고 음악이 되었다. 게다가 호스티스 영화의 시작. 말 그대로, 1970년대에 '별들의 고향'은 거대한 폭풍과 같은 영화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토대로 젊고 감각적이고 사회성이 있는 영화 모임인 '영상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상시대'의 핵심 멤버는 하길종이었다. 서울대 출신의 미국 유학파인 엘리트 감독은 귀국 후 만든 두 편이 참혹하게 검열에서 잘리고 흥행에서 실패한 뒤 최인호 원작을 밑거름으로 해 '시대적 걸작'을 창조해냈다. '바보들의 행진'. 최인호 원작의 병태에 우울한 시대적 감성을 지닌 캐릭터 영철을 세분화시켜 젊은이들의 낭만, 좌절과 방황을 스크린에 담았다. 주제곡 '고래사냥' '왜 불러' '날이 갈수록' 등과 더불어 이 영화는 1970년대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다. 지금도 이 시기에 대학을 다닌 분들이 거나하게 술에 취하면 주먹을 쥔 채로 '고래사냥'을 부르는 것을 가끔 본다. 그들에게 청년 시절은 '고래사냥'의 시절이었다. 이후 하길종은 '속 별들의 고향' '병태와 영자'까지 최인호와 작업을 하다 뇌졸중으로 너무도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이라는 철권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 가혹한 시기에 여전히 따뜻한 낭만주의적 시선의 최인호 원작은 대중들에게 팔려나갔고, 이 소설을 기막히게 영화로 소화한 감독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배창호이다. 배창호는 최인호와 함께 '적도의 꽃' '고래사냥 1, 2' '깊고 푸른 밤' 등을 만들었다. 1970년대가 '별들의 고향'과 '바보들의 행진'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는 단연코 '고래사냥'과 '깊고 푸른 밤'의 시대였다. 거리를 떠돌며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세 청춘의 거칠지만 따뜻한 이야기와 미국에서의 차갑고 눈물 나는 이민 이야기는 최인호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리스트에 또 한 편의 영화를 추가해야 한다. 곽지균 감독의 '겨울나그네'. 대학가의 낭만을 배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첫사랑의 냉철함을 우수적인 분위기로 그린 영화. 거기에는 낭만적 패배주의자의 슬픈 자화상이 새겨져 있어 그를 통해 시대적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영화를 1987년, 안동의 작은 극장에서 보고 한국영화도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었다.
최인호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은 대부분 낭만주의적 경향을 띤다. 사랑의 패배에 가슴 아파하는 격정적인 청춘의 아픔을 지독히도 우수적인 풍경 속에 묘사하고 있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젊음의 아픔은 단지 청춘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춘을 아프게 만든 시대의 상징으로까지 읽힌다. 그렇기에 낭만적이지만, 스스로 죽어가는 인물들의 지독히도 패배적이고 고통스런 모습이 영화를 보는 이들을 빨아들였던 것이다. 그것은 곧 그 시대의 공기였고 표상이었다.
최인호는 엄청난 영화광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영화감독이었다. 최인호가 1976년에 '걷지 말고 뛰어라'로 감독 데뷔한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 검열에서 30분이나 잘려나갔을 때, 제작사인 화천공사 창고에 숨어들어 중요한 장면을 다시 영화 속에 삽입해 상영한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신상옥이 검열에서 삭제된 예고편을 삽입해 상영했다가 구속되었던 시기였으니, 최인호의 그 무모한 용기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그런 그가 영원히 갔다. 화려한 시대를 뒤로한 그가 아픔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가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로 행복했었다.
영화평론가'광운대 교수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